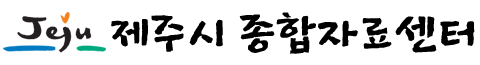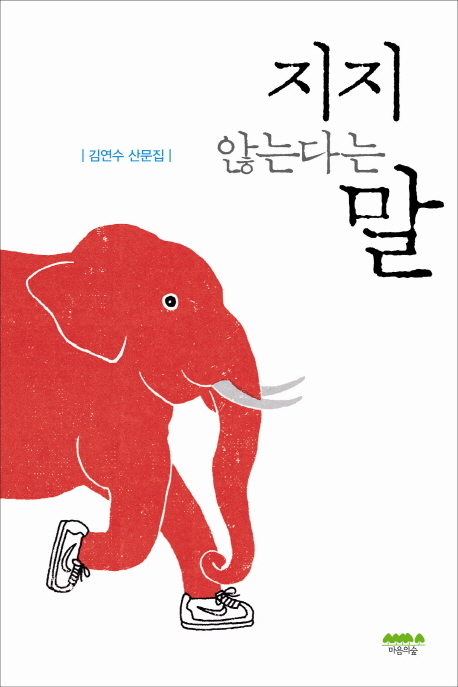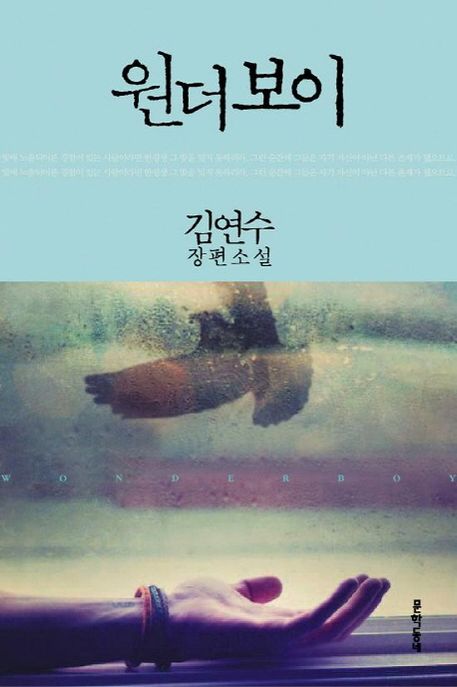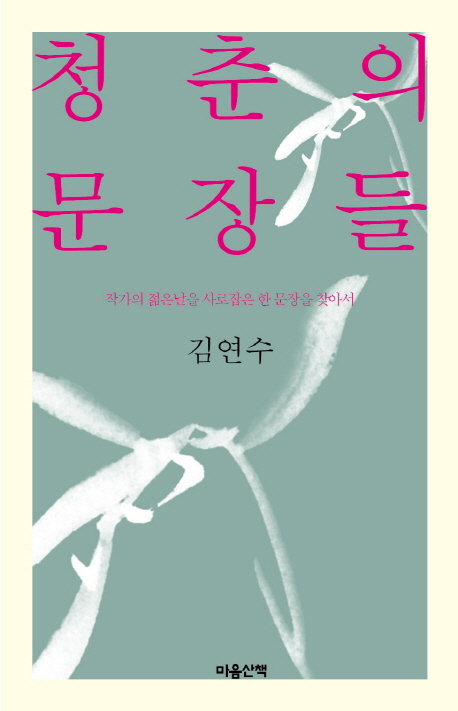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종합자료센터 보존서고 | MG0703107253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MG070310725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종합자료센터 보존서고
책 소개
“이 책을 처음 읽을 두 눈동자에게”
김연수 작가의 산문집 『청춘의 문장들』이 출간 15주년을 맞아 특별 에디션 한정판을 별도로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에서는 ‘특별판 원고’가 추가 수록됐다. 또한 표지와 본문 디자인도 이재민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업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청춘의 덧없는 아름다움을 ‘靑春’이라는 한자의 예각과 섬세한 색감으로 표현한 디자인이다. 2004년 출간된 『청춘의 문장들』은 출간 10주년 특별 산문집 『청춘의 문장들+』와 함께 십여 년이란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고전처럼 끊임없이 인용되고 회자되며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문집이다. 올해로 등단 25주년을 맞은 작가 김연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먼 미래의 사람들도 하리라는 것”을 여전히 믿으며 앞으로도 “소설을 읽고, 일기를 쓰고, 옆에서 걷는 사람의 손을 잡고 (…) 보름달에 소원을 빌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삶은 이토록 짧아서 슬픈 것이지만, 이제는 사라진 누군가를 평생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에 과거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마치 같은 책을 읽는 두 눈동자가, 같은 기도문을 읊조리는 입술이 우리의 세계를 좀더 지속시키는 것과 같이.
― ‘특별판 작가의 말’에서
그러고 보니 봄 시간은 정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포개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돌아오고 어느 때는 나보다 먼저 저 앞에 가 있다 나를 향해 뚜벅뚜벅 자비심 없는 얼굴로 다가오고 때론 한없이 따뜻한 얼굴로 멀어지기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읽은 문장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더구나 그게 봄을 좋아해, 매년 봄을 아주 열심히 기다리는 작가가 골라준 문장이라면 말해 무엇할까. 집에 와 소매를 걷고 부엌 창을 여니 무언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무언가 선선하고 부드럽게, 유쾌하고 애잔하게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렸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방금 전에 활짝 핀 불꽃들이 부드럽게 낙하하고 있었다. 허공에 시간의 테두리를 그리며 빛을 내고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누군가 오래 본 문장, 누군가 오래 볼 문장, 그러니까 여기, 청춘의 문장들이었다.
― 김애란 (소설가)의 추천사에서
2004년판 『청춘의 문장들』
서른다섯의 소설가 김연수의 내면 풍경
나이 서른다섯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체 인생을 70으로 봤을 때, 전반생과 후반생의 기점이 되는 나이, 풀 코스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하프 코스는 완주한 셈이다. 소설 쓰기와 함께 마라톤에도 열심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이처럼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작가 김연수에게 이 산문집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문에서 그는 “내가 사랑한 시절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 안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진 것들, 지금 내게서 빠져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고백한다. 김연수는 러너스 피크(Runner’s Peak)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이미 지나온 안팎의 풍경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거리 주자인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풍경들을 되새기는 이유는 다시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함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책을 쓰는 일은 없을 테니까” 라는 말 속에는 지나온 반생에 대한 결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총 32편의 산문 중 절반 이상이 새로 쓴 전작 산문이다.
“이제 나는 서른다섯 살이 됐다. 앞으로 살 인생은 이미 산 인생과 똑같은 것일까? 깊은 밤, 가끔 누워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불빛을 바라보노라면 모든 게 불분명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내가 살아온 절반의 인생도 흐릿해질 때가 많다. 하물며 살아갈 인생이란.”
―17p
작가의 젊은날을 사로잡은 한 문장을 찾아서
작가에게 있어서 “책을 읽다가 문득문득 목이 메어와 갈피를 덮는 일은 요 몇 년 새 얻은 버릇”이다. 작가는 유년의 추억들, 성장통을 앓았던 청년기, 그리고 글을 쓰게 된 계기 등의 자전적 이야기들을 이백과 두보의 시, 이덕무와 이용휴의 산문, 이시바시 히데노의 하이쿠, 김광석의 노랫말 등 젊은날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문장들과 함께 들려준다.
“삶을 설명하는 데는 때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니까”라는 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작가의 삶 속으로 선명하게 육박해 들어와 힘차게 공명한 문장들이 소개되고 있다. 인용된 문장들은 젊은날의 서사를 끌어내기도 하고, 마무리를 대신하기도 하는 가운데, 애잔함과 여운을 전해주면서 보다 정제되고 열린 공감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흘러서 바다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작가는 젊은날 이백의 시 「장진주」를 읽다가 ‘君不見’ 그 세 글자에 그만 눈이 트이고 말았다고 고백한다. 귓전을 떠나지 않는 그 말의 절실함을 좇아 자전거를 타고 7번국도를 여행했던 일화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작가의 내면 풍경이다.
청춘은 그렇게 한두 조각 꽃잎을 떨구고
서른다섯의 작가가 기억하는 ‘청춘’이란 어떤 모습일까.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서울 큰 병원에 왔다 돌아가는 어머니를 배웅하면서, 두 돌 된 딸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여름날을 만끽하면서, 옛 모습을 찾기 힘들어진 고향 거리를 걸으면서, 작가는 자신을 키워온 것과 사라져간 것들을 두루 추억한다.
작가에게는 고향집 지붕 위에서 별을 바라보며 “나는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다. 천문학과를 지망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됐고, 남들보다 일찍 군복무를 마친 탓에 남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 문장을 읽고, 또 문장을 지어냄으로써 젊은날의 허기를 달랬던 시절을 회상한다. 취직할 생각도 없고, 또 소설가로 성공하겠다는 야망도 없었던 당시의 그에게는 ‘아아, 장차 어찌할꼬, 이 청춘을’이라는 설요의 시가 사무쳤을 법하다. 하지만, “간절히 봄을 기다렸건만 자신이 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깨닫지 못한 채” 보냈던 정릉 산꼭대기 자취방의 나날들이 ‘봄날’이었다는 사실을 작가는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꽃시절이 모두 지나고 나면 봄빛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천만 조각 흩날리고 낙화도 바닥나면 우리가 살았던 곳이 과연 어디였는지 깨닫게 된다”는 무상함을 작가는 전해준다. 하지만,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 지금도 몸이 아프다는 그는, 여전히 청춘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듯하다.
“그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텐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나는 사춘기”라는 말에서 만년 청년이고 싶어하는 작가의 순정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목차
특별판 작가의 말: 이 책을 처음 읽을 두 눈동자에게
책머리에: 한 편의 시와 몇 줄의 문장으로 쓴 서문
내 나이 서른다섯
지금도 슬픈 생각에 고요히 귀기울이면
내리 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물인가, 사랑은
갠 강 4월에 복어는 아니 살쪘어라
내일 쓸쓸한 가운데 술에서 깨고 나면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은은 고령 사람인데
사공서는 다시 노진경을 만났을까?
Ten Days of Happiness
추운 국경에는 떨어지는 매화를 볼 인연 없는데
아는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시간은 흘러가고 슬픔은 지속된다
밤마다 나는 등불 앞에서 저 소리를 들으며
중문 바다에는 당신과 나
한 편의 시와 (살아온 순서대로) 다섯 곡의 노래 이야기
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 들려오누나
청춘을 그렇게 한두 조각 꽃잎을 떨구면서
등나무엔 초승달 벌써 올라와
잊혀지면 그만일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네
제발 이러지 말고 잘 살아보자
백만 마리 황금의 새들아, 어디에서 잠을 자니?
알지 못해라, 쇠줄을 끌러줄 사람 누구인가
진실로 너의 기백을 공부로써 구제한다면
앞쪽 게르를 향해 가만-히 살핀다
서리 내린 연잎은 그 푸르렀던 빛을 따라 주름져 가더라도
어둠을 지나지 않으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
매실은 신맛을 남겨 이빨이 약해지고
검은 고양이 아름다운 귀울림 소리처럼
그대를 생각하면서도 보지 못한 채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 그림자, 언제나 못에 드리워져
이슬이 무거워 난초 이파리 지그시 고개를 수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