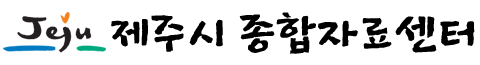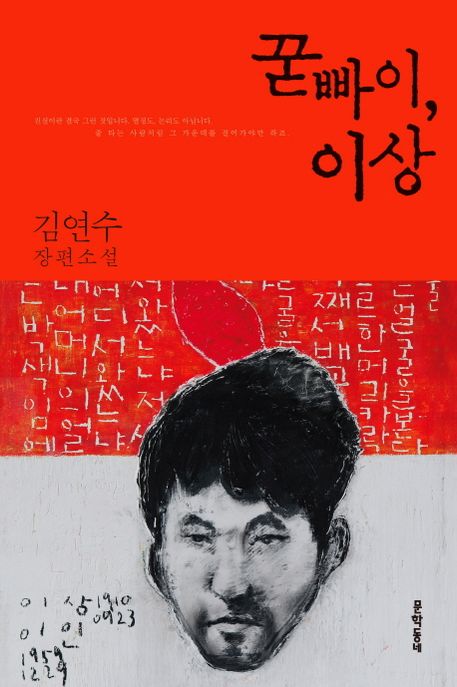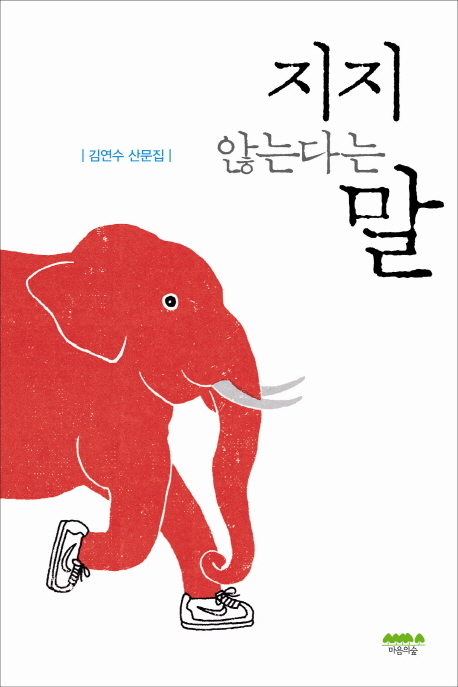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5417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541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혹은 이 세계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뭔가를 끄적이는 일이었다. (……) 그 문장들이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 십 년간, 나는 어떤 대답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세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지, 이렇게 나쁜 세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오직 고통만이 남았을 때조차 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지…… 하지만 어떤 대답도 나는 들을 수 없었다. (……) 자신의 밖으로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세계의 끝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내게 바깥을 향해서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니 대답을 들으려면 세존의 말씀대로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 길 몸뚱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리라. 그 일이 내게는 글쓰기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혹은 이 세계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뭔가를 끄적이는 일이었다.(6~8쪽)
『시절일기_우리가 함께 지나온 밤』은 김연수가 지난 십 년간 보고 듣고 읽고 써내려간 한 개인의 일기이자 작가로서의 기록이다. 그 시간 안에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의 평범한 개인이자 가장이었고, 어쩌면 가장 치열하게 한 시대를 고민했을 사십대의 어른이었고, 지금-여기를 늘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기록해야 하는 작가였다. 그는 끊임없이, 쓰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멈칫거리고 그리고 다시 쓰는 사람이다. 시를 발표하고 장편소설을 펴내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새 이십오 년, 그는 여전히 글쓰기라는 업業에 대해 묻고 또 묻는다. 그 질문하는 일이 그에게는 곧 ‘쓰기’인 셈이다.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타자의 고통 앞에서 문학은 충분히 애도할 수 없다. 검은 그림자는 찌꺼기처럼 마음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애도를 속히 완결지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해석이 불가능해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모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문학의 일이다. 그러므로 영구히 다시 쓰고 읽어야 한다. 날마다 노동자와 일꾼과 농부처럼, 우리에게 다시 밤이 찾아올 때까지.(49쪽)
소설가란 소설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소설가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얘기다. 소설 쓰기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다. 소설가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소설을 쓴다. (……) 새로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 그게 바로 데뷔작 이후, 그을린 이후, 모든 소설가의 운명이다.(52~53쪽)
아마도 언제나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 김연수는 1970년생이다. 지난 십 년, 청년이던 작가 김연수는 온전히 사십대를 지나보냈다. 사십대-어른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용산참사와 세월호의 침몰,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6년의 촛불들…… 등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겪고 견뎌내고 맞이했다. 그의 시선과 질문과 고민들은 그사이 더 예민해지고 더 깊어졌다. 그런 그의 시간 속에, 당연히 ‘우리’ 또한 함께 있었다. 그것은 그와 우리가 함께 지나온, 함께 견뎌온, 함께 맞이한 시간이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눈을 감았고, 말을 잃었고, 펜을 놓았다. 다시 눈을 뜨고 말을 찾고 펜을 들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제 삶의 시간조차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작가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 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들은 결국 그의 업業인 글쓰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책 속의 질문들과 어떤 대답들은 어쩌면 지금의 김연수라는 소설가가 있게 한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새삼 확인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의 문학/글쓰기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는 글쓰기를 통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체되는 시간이 자기 인생이 된다고 할 때, 인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런 의문이 저를 소설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 역사가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한없이 지체되는 역사에 관심이 갑니다. 인과율이 지체되는 동안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우연과 신화와 운명에 끌립니다. (……)
우리의 삶은 구불구불 흘러내려가는 강을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곧잘 지체되며 때로는 거꾸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지만, 그때가 바로 흐름에 몸을 맡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쉼없이 흘러가는 역사에 온전하게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근대 이후의 인간, 동시대인이 됩니다. 그때 저는 온전히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깊은 밤의 한가운데에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역사의 흐름에 몸을 내맡길 때, 우리의 절망은 서로에게 읽힐 수 있습니다. 문학의 위로는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296~301쪽)
책을 읽고, 그림과 영화와 연극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는 쉬지 않고 ‘쓰고’, 계속해서, 점점 더, 끊임없이, 소설가가 ‘되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쉼없이 ‘쓰는’ 그를 우리가 ‘읽는’ 동안, 우리는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간을 발견하게 된다. 그 힘이 우리를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견디기 위해서 소설가들은 소설을 쓰고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고 시인들은 시를 쓴다. 마찬가지로 견디기 위해 사람들은 소설과 시를 읽고 영화를 본다. 애도를 완결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읽고 써야만 한다.(44쪽)
이 책은 어쩌면 그를 통해, 함께 (쓰고) 읽는 우리의 일기일지도 모른다.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동안 그가 작가로서, 한 개인으로서 써내려간 매일의 기록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느냐면,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에.
_결국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씨는 아무리 어두워도, 또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 대신에 그동안 뭔가를 하고 싶다며, 십 년 정도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서예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이지연씨는 말한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붓놀림 같은 것들이 눈에 삼삼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큰 빛이 되면 참 좋겠구나, 밝은 빛이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83쪽)
어둠 속에서는 조금의 빛이라도 너무나 눈부시게 느껴진다. 암흑 속의 빛. 그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빛이다. 그렇기에 기적이다. 아들을 잃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는 직접 겪지 않아도 알고 있다.
지난 십 년간의 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밤의 시간을 함께 지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빛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와 우리가 함께 지나온 밤의 기록이며 그 안에서 발견한 작은 빛의 기록이다. 지금은 마치 어떤 절망상태 속에 있는 듯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결국, 함께,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둠만을 볼 뿐이다. 그게 바로 인간 의 슬픔과 절망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다르게 보려면 빛이 필요하다. (……) 어떻게 하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이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하룻밤 자고 일어났 더니 온 동네 꽃들이 모두 피어나던, 내 고향의 부활절 풍경이 그런 새로운 빛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94쪽)
지난 십 년간 김연수가 읽은 책과 세상의 기록, 글쓰기에 대한 질문과 그 안에서 발견한 어떤 빛에 대한 이야기랄 수 있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ps 사랑의 단상, 2014년」은 단편소설이다. 그것이 끝난 뒤에야 가능한 사랑.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그후의 일이다.
이제는 당신의 뒷모습만 떠오릅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더라,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뒷모습만, 그저 뒷모습만. 내가 당신의 뒷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었는데도 가을의 거리에서 돌아서 걸어가던 그 뒷모습, 여름의 방에서 땀을 흘리며 잠들었던 당신의 뒷모습만 떠오릅니다. (……)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내겐 손이나 발 혹은 심장 같은 게 없어도, 심지어 나란 사람이 애당초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했으니. 그럼에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서 이 세상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게 됐다는 게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쓸모는 거기에 있었습니다.(327~328쪽)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기록들. 이것은 비단 사랑만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 소설은 지난 십 년간 작가가 되묻고 되물었던 질문에 대한 다른 방식의 대답일지도.
지난 십 년간, 나는 어떤 대답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세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지, 이렇게 나쁜 세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오직 고통만이 남았을 때조차 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지…… 하지만 어떤 대답도 나는 들을 수 없었다. (……) 자신의 밖으로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세계의 끝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내게 바깥을 향해서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니 대답을 들으려면 세존의 말씀대로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 길 몸뚱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리라. 그 일이 내게는 글쓰기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혹은 이 세계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뭔가를 끄적이는 일이었다.(6~8쪽)
『시절일기_우리가 함께 지나온 밤』은 김연수가 지난 십 년간 보고 듣고 읽고 써내려간 한 개인의 일기이자 작가로서의 기록이다. 그 시간 안에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의 평범한 개인이자 가장이었고, 어쩌면 가장 치열하게 한 시대를 고민했을 사십대의 어른이었고, 지금-여기를 늘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기록해야 하는 작가였다. 그는 끊임없이, 쓰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멈칫거리고 그리고 다시 쓰는 사람이다. 시를 발표하고 장편소설을 펴내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새 이십오 년, 그는 여전히 글쓰기라는 업業에 대해 묻고 또 묻는다. 그 질문하는 일이 그에게는 곧 ‘쓰기’인 셈이다.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타자의 고통 앞에서 문학은 충분히 애도할 수 없다. 검은 그림자는 찌꺼기처럼 마음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애도를 속히 완결지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해석이 불가능해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모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문학의 일이다. 그러므로 영구히 다시 쓰고 읽어야 한다. 날마다 노동자와 일꾼과 농부처럼, 우리에게 다시 밤이 찾아올 때까지.(49쪽)
소설가란 소설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소설가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얘기다. 소설 쓰기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다. 소설가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소설을 쓴다. (……) 새로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 그게 바로 데뷔작 이후, 그을린 이후, 모든 소설가의 운명이다.(52~53쪽)
아마도 언제나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 김연수는 1970년생이다. 지난 십 년, 청년이던 작가 김연수는 온전히 사십대를 지나보냈다. 사십대-어른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용산참사와 세월호의 침몰,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6년의 촛불들…… 등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겪고 견뎌내고 맞이했다. 그의 시선과 질문과 고민들은 그사이 더 예민해지고 더 깊어졌다. 그런 그의 시간 속에, 당연히 ‘우리’ 또한 함께 있었다. 그것은 그와 우리가 함께 지나온, 함께 견뎌온, 함께 맞이한 시간이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눈을 감았고, 말을 잃었고, 펜을 놓았다. 다시 눈을 뜨고 말을 찾고 펜을 들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제 삶의 시간조차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작가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 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들은 결국 그의 업業인 글쓰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책 속의 질문들과 어떤 대답들은 어쩌면 지금의 김연수라는 소설가가 있게 한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새삼 확인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의 문학/글쓰기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는 글쓰기를 통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체되는 시간이 자기 인생이 된다고 할 때, 인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런 의문이 저를 소설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 역사가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한없이 지체되는 역사에 관심이 갑니다. 인과율이 지체되는 동안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우연과 신화와 운명에 끌립니다. (……)
우리의 삶은 구불구불 흘러내려가는 강을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곧잘 지체되며 때로는 거꾸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지만, 그때가 바로 흐름에 몸을 맡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쉼없이 흘러가는 역사에 온전하게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근대 이후의 인간, 동시대인이 됩니다. 그때 저는 온전히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깊은 밤의 한가운데에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역사의 흐름에 몸을 내맡길 때, 우리의 절망은 서로에게 읽힐 수 있습니다. 문학의 위로는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296~301쪽)
책을 읽고, 그림과 영화와 연극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는 쉬지 않고 ‘쓰고’, 계속해서, 점점 더, 끊임없이, 소설가가 ‘되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쉼없이 ‘쓰는’ 그를 우리가 ‘읽는’ 동안, 우리는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간을 발견하게 된다. 그 힘이 우리를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견디기 위해서 소설가들은 소설을 쓰고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고 시인들은 시를 쓴다. 마찬가지로 견디기 위해 사람들은 소설과 시를 읽고 영화를 본다. 애도를 완결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읽고 써야만 한다.(44쪽)
이 책은 어쩌면 그를 통해, 함께 (쓰고) 읽는 우리의 일기일지도 모른다.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동안 그가 작가로서, 한 개인으로서 써내려간 매일의 기록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느냐면,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에.
_결국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씨는 아무리 어두워도, 또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 대신에 그동안 뭔가를 하고 싶다며, 십 년 정도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서예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이지연씨는 말한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붓놀림 같은 것들이 눈에 삼삼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큰 빛이 되면 참 좋겠구나, 밝은 빛이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83쪽)
어둠 속에서는 조금의 빛이라도 너무나 눈부시게 느껴진다. 암흑 속의 빛. 그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빛이다. 그렇기에 기적이다. 아들을 잃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는 직접 겪지 않아도 알고 있다.
지난 십 년간의 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밤의 시간을 함께 지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빛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와 우리가 함께 지나온 밤의 기록이며 그 안에서 발견한 작은 빛의 기록이다. 지금은 마치 어떤 절망상태 속에 있는 듯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결국, 함께,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둠만을 볼 뿐이다. 그게 바로 인간 의 슬픔과 절망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다르게 보려면 빛이 필요하다. (……) 어떻게 하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이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하룻밤 자고 일어났 더니 온 동네 꽃들이 모두 피어나던, 내 고향의 부활절 풍경이 그런 새로운 빛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94쪽)
지난 십 년간 김연수가 읽은 책과 세상의 기록, 글쓰기에 대한 질문과 그 안에서 발견한 어떤 빛에 대한 이야기랄 수 있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ps 사랑의 단상, 2014년」은 단편소설이다. 그것이 끝난 뒤에야 가능한 사랑.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그후의 일이다.
이제는 당신의 뒷모습만 떠오릅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더라,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뒷모습만, 그저 뒷모습만. 내가 당신의 뒷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었는데도 가을의 거리에서 돌아서 걸어가던 그 뒷모습, 여름의 방에서 땀을 흘리며 잠들었던 당신의 뒷모습만 떠오릅니다. (……)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내겐 손이나 발 혹은 심장 같은 게 없어도, 심지어 나란 사람이 애당초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했으니. 그럼에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서 이 세상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게 됐다는 게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쓸모는 거기에 있었습니다.(327~328쪽)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기록들. 이것은 비단 사랑만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 소설은 지난 십 년간 작가가 되묻고 되물었던 질문에 대한 다른 방식의 대답일지도.
목차
프롤로그 내가 쓴 글, 저절로 쓰여진 글 5
제1부 장래희망은, 다시 할머니 13
제2부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 57
제3부 그렇게 이별은 노래가 된다 109
제4부 나의 올바른 사용법 151
제5부 그을린 이후의 소설가 221
참고문헌+ 302
ps 사랑의 단상, 2014년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