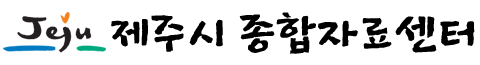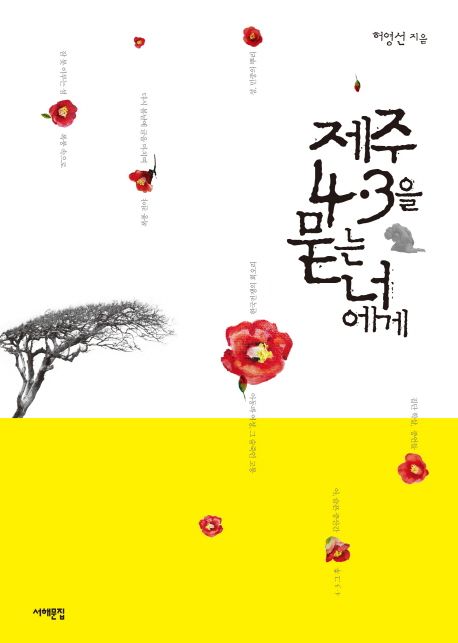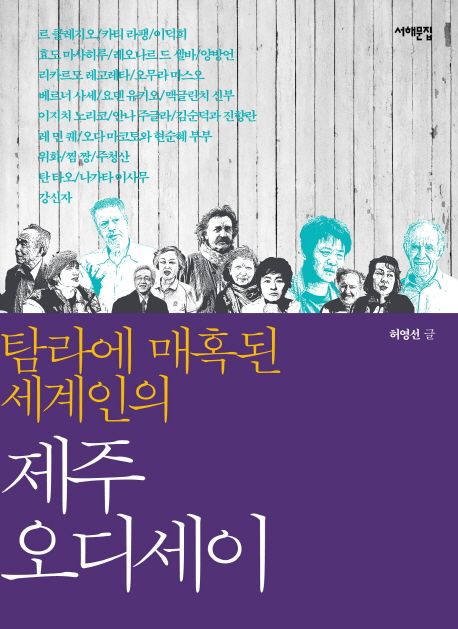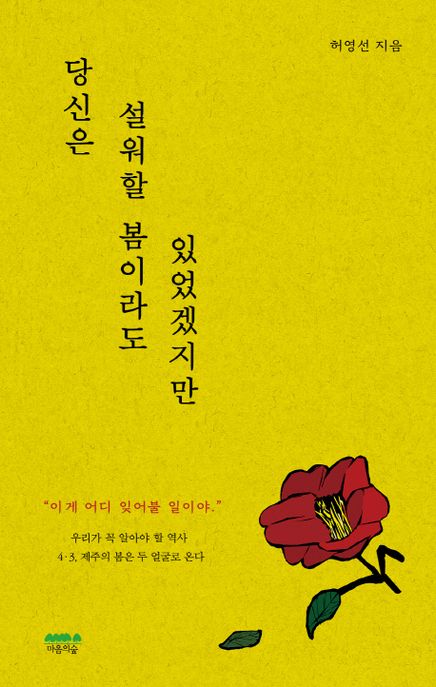일반자료문학동네시인선 095
해녀들: 허영선 시집
- 저자/역자
- 허영선 지음
- 펴낸곳
- 문학동네
- 발행년도
- 2017
- 형태사항
- 116p.; 23cm
- 총서사항
- 문학동네시인선; 095
- ISBN
- 9788954643184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811.6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453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453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문학동네시인선 095 허영선 시집 『해녀들』이 출간되었다. 제주에서 태어나 지금껏 그곳 땅을 지키며 살아온 허영선 시인의 세번째 시집으로 13년 만에 선보이는 신간이기도 하다. 제목에서 짐작이 되듯 이번 시집은 온전히 ‘해녀들’을 위한 시들이고, 오롯이 ‘해녀들’에게 바치는 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해녀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우리들을 위한 시들이기도 하고, 일견 ‘해녀들’에 대해 잘 알기를 바라는 시인을 위한 시들이기도 하다.
받침 하나 없이 쉽게 발음되는 해녀, 그 해녀가 누구인지 누가 모를까 싶은데 막상 해녀에 대해 누가 아느냐 물으면 대부분 입을 다물 것만 같은 막막함이 다분해 이를 벗겨보자 할 작심에 쓰인 이 시집은 총 2부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1부는 '해녀전'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울 틈 물 틈 없어야 한다'는 부제가 달려 있다. '전(傳)'이라 하니 '사(史)'이겠구나 싶은 짐작 속에 역사 속 우리 해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목부터가 이들 해녀들의 이름이다. 이름이 곧 시가 되는 인생사, 이는 제 온몸을 제 하나의 생을 말마따나 말이 되게 세상에 던졌다는 증거일 텐데 그래서일까,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일이 참으로 뼈아프다. 해녀 김옥련, 해녀 고차동, 해녀 정병춘, 해녀 덕화, 해녀 권연, 해녀 양금녀, 해녀 양의헌, 해녀 홍석낭, 해녀 문경수, 해녀 강안자, 해녀 김순덕, 해녀 현덕선, 해녀 말선이, 해녀 박옥랑, 해녀 고인오, 해녀 김태매, 해녀 고태연, 해녀 매옥이, 해녀 장분다, 해녀 김승자, 해녀 오순아……
비록 한 편의 시로 완성되어 시집 속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함께 물질했던 수많은 이름 모를 우리 해녀들 실은 물거품처럼 얼마나 많았을까. 이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징용 물질을 끌려가기도 했고, 제주해녀항쟁으로 모진 고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4?3이 휘몰고 간 '무남촌'을 지키느라 억척으로 매일같이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짐작할 수도 없고 또 짐작한다 해도 감히 이해한다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난한 해녀들의 삶. 부제로 삼은 구절 '울 틈 물 틈 없어야 한다'라는 대목에서 이제야 무릎이 툭 꺾이는 바다. '틈'을 보이고 '틈'에 빠지는 순간 해녀들에게 닥치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걸, 그 죽음은 비단 해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드리울 생의 암막이라는 걸 그들은 해녀가 된 그 순간부터 알아버렸던 탓일 게다.
2부는 '제주 해녀들'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바다에 들겠는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1부의 시편들을 건너왔으니 2부의 부제가 한눈에 이해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얹었기 때문이다. 호시탐탐 죽음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바다를 향해 자발적으로 뛰어듦을 삶으로 택한 해녀의 의지 뒤에는 오로지 그 '사랑' 말고는 있을 게 없기 때문이다. 보다 손쉬운 이해를 바란다면 2부를 읽기 전에 말미에 자리한 시인의 산문 「그들은 물에서 시를 쓴다」를 먼저 읽어봐도 좋겠다. 요긴한 해설서가 되어주기는 할 듯싶다. "부끄러우면 물질하지 못한다"가 그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비울 것 비우고 껴안을 건 껴안으라는 당부의 말을 먼저 새기고 돌아와 2부의 시편들을 읽어내면 그 읽기에 탄성이 절로 붙음은 물론이니 말이다.
딸이어서 뛰어들 수 있었고, 아내여서 뛰어들 수 있었고, 엄마여서 뛰어들 수 있었고, 할미여서 뛰어들 수 있었던 바다바라기 해녀. 젖줄을 바다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말라버릴 젖줄의 두려움을 평생 몸으로 새기고 사는 해녀들.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건 사랑이 시키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 그 사랑의 근원이 말로 다할 수는 없음이라 할 때 이는 ‘시’의 그러함과 똑 닮아 있기도 한 듯하다. 특히 2부의 제목들을 보자면 시의 정의로 치환되는 대목이 여럿이다. ‘우린 몸을 산처럼 했네’, ‘우리는 우주의 분홍 젖꼭지들’, ‘한순간의 결행을 위해 나는 살았죠’, ‘파도 없는 오늘이 어디 있으랴’, '바닷속 호흡은 무엇을 붙잡는가', '먹물 튕겨 달아나는 문어처럼', '잠든 파도까지 쳐라!', ‘모든 시작은 해 진 뒤에 있다’, '울고 싶을 땐 물에서 울어라’,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 등등에서 느껴지는 시라는 정신의 등뼈. 시를 쓸 때 백지와 나 사이의 긴장감과 거리감을 바다와 해녀 사이에 놓아봤을 때 일견 유지되는 생의 팽팽함. 이렇듯 시와 해녀는 똑 닮아 있구나. 이렇게 시와 해녀는 쏙 빼닮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나는『해녀들』을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로 읽는다. “어떤 절박함 없이 어떤 극한을 견디겠는가.” 삶이 무엇인가를 말없는 물노동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참으로 귀한 시집, 뜨거운 눈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섞여 덤덤한 듯 일렁이고 있는 시집『해녀들』을 나는 한 편의 탄탄한 시론으로 읽는다. 해녀들은 물에서 시를 쓴다. 없어질 것을 운명으로 아는 시를!
받침 하나 없이 쉽게 발음되는 해녀, 그 해녀가 누구인지 누가 모를까 싶은데 막상 해녀에 대해 누가 아느냐 물으면 대부분 입을 다물 것만 같은 막막함이 다분해 이를 벗겨보자 할 작심에 쓰인 이 시집은 총 2부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1부는 '해녀전'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울 틈 물 틈 없어야 한다'는 부제가 달려 있다. '전(傳)'이라 하니 '사(史)'이겠구나 싶은 짐작 속에 역사 속 우리 해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목부터가 이들 해녀들의 이름이다. 이름이 곧 시가 되는 인생사, 이는 제 온몸을 제 하나의 생을 말마따나 말이 되게 세상에 던졌다는 증거일 텐데 그래서일까,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일이 참으로 뼈아프다. 해녀 김옥련, 해녀 고차동, 해녀 정병춘, 해녀 덕화, 해녀 권연, 해녀 양금녀, 해녀 양의헌, 해녀 홍석낭, 해녀 문경수, 해녀 강안자, 해녀 김순덕, 해녀 현덕선, 해녀 말선이, 해녀 박옥랑, 해녀 고인오, 해녀 김태매, 해녀 고태연, 해녀 매옥이, 해녀 장분다, 해녀 김승자, 해녀 오순아……
비록 한 편의 시로 완성되어 시집 속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함께 물질했던 수많은 이름 모를 우리 해녀들 실은 물거품처럼 얼마나 많았을까. 이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징용 물질을 끌려가기도 했고, 제주해녀항쟁으로 모진 고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4?3이 휘몰고 간 '무남촌'을 지키느라 억척으로 매일같이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짐작할 수도 없고 또 짐작한다 해도 감히 이해한다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난한 해녀들의 삶. 부제로 삼은 구절 '울 틈 물 틈 없어야 한다'라는 대목에서 이제야 무릎이 툭 꺾이는 바다. '틈'을 보이고 '틈'에 빠지는 순간 해녀들에게 닥치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걸, 그 죽음은 비단 해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드리울 생의 암막이라는 걸 그들은 해녀가 된 그 순간부터 알아버렸던 탓일 게다.
2부는 '제주 해녀들'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바다에 들겠는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1부의 시편들을 건너왔으니 2부의 부제가 한눈에 이해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얹었기 때문이다. 호시탐탐 죽음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바다를 향해 자발적으로 뛰어듦을 삶으로 택한 해녀의 의지 뒤에는 오로지 그 '사랑' 말고는 있을 게 없기 때문이다. 보다 손쉬운 이해를 바란다면 2부를 읽기 전에 말미에 자리한 시인의 산문 「그들은 물에서 시를 쓴다」를 먼저 읽어봐도 좋겠다. 요긴한 해설서가 되어주기는 할 듯싶다. "부끄러우면 물질하지 못한다"가 그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비울 것 비우고 껴안을 건 껴안으라는 당부의 말을 먼저 새기고 돌아와 2부의 시편들을 읽어내면 그 읽기에 탄성이 절로 붙음은 물론이니 말이다.
딸이어서 뛰어들 수 있었고, 아내여서 뛰어들 수 있었고, 엄마여서 뛰어들 수 있었고, 할미여서 뛰어들 수 있었던 바다바라기 해녀. 젖줄을 바다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말라버릴 젖줄의 두려움을 평생 몸으로 새기고 사는 해녀들.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건 사랑이 시키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 그 사랑의 근원이 말로 다할 수는 없음이라 할 때 이는 ‘시’의 그러함과 똑 닮아 있기도 한 듯하다. 특히 2부의 제목들을 보자면 시의 정의로 치환되는 대목이 여럿이다. ‘우린 몸을 산처럼 했네’, ‘우리는 우주의 분홍 젖꼭지들’, ‘한순간의 결행을 위해 나는 살았죠’, ‘파도 없는 오늘이 어디 있으랴’, '바닷속 호흡은 무엇을 붙잡는가', '먹물 튕겨 달아나는 문어처럼', '잠든 파도까지 쳐라!', ‘모든 시작은 해 진 뒤에 있다’, '울고 싶을 땐 물에서 울어라’,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 등등에서 느껴지는 시라는 정신의 등뼈. 시를 쓸 때 백지와 나 사이의 긴장감과 거리감을 바다와 해녀 사이에 놓아봤을 때 일견 유지되는 생의 팽팽함. 이렇듯 시와 해녀는 똑 닮아 있구나. 이렇게 시와 해녀는 쏙 빼닮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나는『해녀들』을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로 읽는다. “어떤 절박함 없이 어떤 극한을 견디겠는가.” 삶이 무엇인가를 말없는 물노동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참으로 귀한 시집, 뜨거운 눈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섞여 덤덤한 듯 일렁이고 있는 시집『해녀들』을 나는 한 편의 탄탄한 시론으로 읽는다. 해녀들은 물에서 시를 쓴다. 없어질 것을 운명으로 아는 시를!
목차
시인의 말
1부 해녀전
- 울 틈 물 틈 없어야 한다
해녀들
해녀 김옥련 1
해녀 김옥련 2
해녀 고차동
해녀 정병춘
해녀 덕화
해녀 권연
해녀 양금녀
해녀 양의헌 1
해녀 양의헌 2
해녀 홍석낭 1
해녀 홍석낭 2
해녀 문경수
해녀 강안자
해녀 김순덕
해녀 현덕선
해녀 말선이
해녀 박옥랑
해녀 고인오
해녀 김태매
해녀 고태연
해녀 매옥이
해녀 장분다
해녀 김승자
해녀 오순아
2부 제주 해녀들
-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바다에 들겠는가
우린 몸을 산처럼 했네
몸국 한 사발
북촌 해녀사
우리 애기 울면 젖 호끔 멕여줍서
우리는 우주의 분홍 젖꼭지들
한순간의 결행을 위해 나는 살았죠
파도 없는 오늘이 어디 있으랴
다려도엔 해녀콩들 모여 삽니다
바닷속 호흡은 무엇을 붙잡는가
먹물 튕겨 달아나는 문어처럼
잠든 파도까지 쳐라!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바다에 들겠는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야 만날 수 있나
우리가 걷는 바당올레는
물질만 물질만 하였지
혹여 제주섬을 아시는가
심장을 드러낸 저 붉은 칸나
테왁이 말하기를
모든 시작은 해 진 뒤에 있다
내 먹은 힘으로 사랑을 낳았던가
울고 싶을 땐 물에서 울어라
단 한 홉으로 날려라
딸아, 너는 물의 딸이거늘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
어머니, 당신은 아직도 푸른 상군이어요
산문|그들은 물에서 시를 쓴다
추천의 글|고은(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