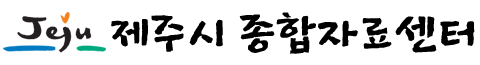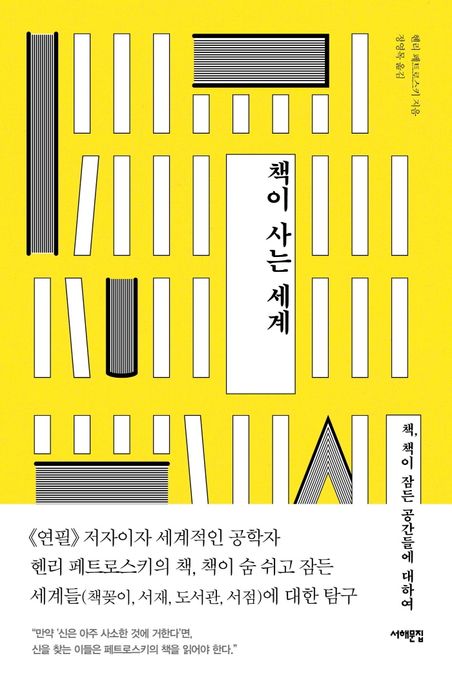
일반자료
책이 사는 세계: 책, 책이 잠든 공간들에 대하여
- 저자/역자
- 헨리 페트로스키 지음 / 정영목 옮김
- 펴낸곳
- 서해문집
- 발행년도
- 2021
- 형태사항
- 376p.: 23cm
- 원서명
- (The)Book on the bookshelf Book on the bookshelf
- ISBN
- 9791190893572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020.9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658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658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책이 우리 세계에 처음 발 딛는 장소,
책이 거하며,
책이 잠드는 장소에 대한 시론
《연필》 저자이자, 세계적인 공학자이자, 사물들의 철학자, ‘작게 쓰기’의 대가
헨리 페트로스키
“만약 ‘신은 아주 사소한 것에 거한다’면, 신을 찾는 이들은 페트로스키의 책을 읽어야 한다.”
_《라이브러리 저널》
두루마리 텍스트를 담아두던 상자에서부터
책을 사슬로 묶던 시기를 지나 현대의 책장에 이르기까지___________
왜 책꽂이 선반은 수평으로 놓여 있으며, 왜 책들은 그 위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걸까?
“인간은 책보다 오래 사는 구조물을 짓지 못한다.”
19세기 시인 유진 피치 웨어의 말이다. 책을 담는 그릇이 언제나 책 자체보다 작아지고 만다는 문제에 관한 한 이 말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책은 주변 공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아서, 한번 책이 쌓이기 시작하면 돌이킬 길이 없다. 책장은 책들로 꽉 차다 못해 책등을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빽빽한 숲을 이룰 것이며, 책장에서 흘러넘친 책들이 바닥에까지 수북이 쌓이게 될 것이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면 새 책장이 필요해지지만 이 새로운 빈 공간은 잠시뿐이다. 새 책들이 꽂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꽉 차버린다. 책장 선반은 서서히 휘어지기 시작한다.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크지 않은 조립식 책장은 선반 지지대가 부러지거나 선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서점에서야 팔리지 않는 책을 애초에 들여놓지 않거나 반품함으로써 공간을 유지하지만, 책을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도서관에서는 서고를 확장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일쑤다(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여 아무리 단단한 책장이라 한들, 아무리 넓은 서고라 한들, 이들은 책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새 책장을 들여놓는 속도보다 새 책을 들여놓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이 빽빽한 책장들로 둘러싸인 공간에 들어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책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책뿐이다. 심지어 책장이 비어 있더라도 그렇다. 텅 빈 책장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수평을 이룬 선반들이 아니라 거기 부재하는 책이다. 책장에서 비어 있는 칸은 어서 메꾸어야 할 구멍일 뿐, 책장 자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 책꽂이는 그 목적상 그렇게 규정된 물건이기 때문이다. 책이 놓이지 않은 평평한 나무판을 책꽂이라 하지 않듯(그릇이 놓이면 그릇 선반이, 화병이 놓이면 장식 선반이 될 것이다) 책꽂이 이야기는 거기에 책이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오로지 맥락 안에서만, 그 용도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니게 되는 사물의 이야기다. 그렇다. 결국 평범한 선반을 책꽂이로 만드는 것은 책이다. 책이 놓이기 전에 선반은 단지 선반일 뿐이어서, 책꽂이 이야기는 책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책꽂이 없는 책을 보지도 않는다. 물론 책은 책꽂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바닥에 쌓아둘 수도, 상자에 담아 다락 한구석에 치워놓을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책이 아니라 짐에 가깝겠지만 어쨌든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아무리 튼튼한 책 탑을 쌓는다 한들, 이렇게 쌓은 탑에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 맨 밑바닥에 깔린 책을 꺼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탑을 해체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할까? 낮은 탑을 여러 개 쌓는다면 어떨까? 그런데, 그렇다면, 책등에 적힌 책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일이 허리를 굽혀가면서 확인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야 우리는 책꽂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벽에 달린 수평 선반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책이 존재하는 곳 어디서나 볼 수 있는 5단 책장 같은 보편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책에 가려 보이지 않았거나 볼 생각도 않았던 부분을 그제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책꽂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진을 찍을 때 뒷줄에 선 이들이 밟고 올라선 계단처럼, 거기 있지만 없는 것이다. 책꽂이는 책을 진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 혹은 책을 전시하기 위한 액자 틀 같은 것이지 서재, 서점, 도서관 등에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서재에서든 도서관에서든 더 많은 책을 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방법을 찾는 분투 속에서 책꽂이의 형태가 바뀌고, 책꽂이가 놓이는 방식이 바뀌고, 그리하여 책의 형태까지도 바뀌게 된 역사는 (책꽂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존재했지만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것처럼 희미해졌다.
《책이 사는 세계》는 바로 이 책꽂이가 거쳐온 역사를 다룬다. 우리는 오늘날 책꽂이에 책을 꽂는 방식, 즉 책등이 책등 바깥을 향하도록 해서 수직으로 꽂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책을 다른 방식으로 꽂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일조차 드물지만, 책은 아주 오랫동안 두루마리 형태로 누워 잠들었으며, 긴 세월 사슬에 묶여 지냈다. 지금은 서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지만 선반 위에 표지가 보이도록 진열되기도 했으며, 책등이 책장 안쪽을 향해 꽂히기도 했다. 책등이 책장 바깥을 향하도록 꽂히게 된 다음에야 책은 등에 제 이름과 자신을 집필한 이의 이름을 적게 됐고, 일정한 크기와 길이로 장정하게 됐다. 우리가 지금처럼 책을 색깔이나 길이에 맞춰, 혹은 다른 어떤 기준에 맞춰 책장에 아름답게 꽂아둘 수 있는 것은 책 자체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책꽂이의 변화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책꽂이는 책을 보관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책꽂이는 책의 형식을, 우리가 책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들었다고.
책이 거하며,
책이 잠드는 장소에 대한 시론
《연필》 저자이자, 세계적인 공학자이자, 사물들의 철학자, ‘작게 쓰기’의 대가
헨리 페트로스키
“만약 ‘신은 아주 사소한 것에 거한다’면, 신을 찾는 이들은 페트로스키의 책을 읽어야 한다.”
_《라이브러리 저널》
두루마리 텍스트를 담아두던 상자에서부터
책을 사슬로 묶던 시기를 지나 현대의 책장에 이르기까지___________
왜 책꽂이 선반은 수평으로 놓여 있으며, 왜 책들은 그 위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걸까?
“인간은 책보다 오래 사는 구조물을 짓지 못한다.”
19세기 시인 유진 피치 웨어의 말이다. 책을 담는 그릇이 언제나 책 자체보다 작아지고 만다는 문제에 관한 한 이 말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책은 주변 공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아서, 한번 책이 쌓이기 시작하면 돌이킬 길이 없다. 책장은 책들로 꽉 차다 못해 책등을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빽빽한 숲을 이룰 것이며, 책장에서 흘러넘친 책들이 바닥에까지 수북이 쌓이게 될 것이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면 새 책장이 필요해지지만 이 새로운 빈 공간은 잠시뿐이다. 새 책들이 꽂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꽉 차버린다. 책장 선반은 서서히 휘어지기 시작한다.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크지 않은 조립식 책장은 선반 지지대가 부러지거나 선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서점에서야 팔리지 않는 책을 애초에 들여놓지 않거나 반품함으로써 공간을 유지하지만, 책을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도서관에서는 서고를 확장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일쑤다(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여 아무리 단단한 책장이라 한들, 아무리 넓은 서고라 한들, 이들은 책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새 책장을 들여놓는 속도보다 새 책을 들여놓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이 빽빽한 책장들로 둘러싸인 공간에 들어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책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책뿐이다. 심지어 책장이 비어 있더라도 그렇다. 텅 빈 책장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수평을 이룬 선반들이 아니라 거기 부재하는 책이다. 책장에서 비어 있는 칸은 어서 메꾸어야 할 구멍일 뿐, 책장 자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 책꽂이는 그 목적상 그렇게 규정된 물건이기 때문이다. 책이 놓이지 않은 평평한 나무판을 책꽂이라 하지 않듯(그릇이 놓이면 그릇 선반이, 화병이 놓이면 장식 선반이 될 것이다) 책꽂이 이야기는 거기에 책이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오로지 맥락 안에서만, 그 용도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니게 되는 사물의 이야기다. 그렇다. 결국 평범한 선반을 책꽂이로 만드는 것은 책이다. 책이 놓이기 전에 선반은 단지 선반일 뿐이어서, 책꽂이 이야기는 책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책꽂이 없는 책을 보지도 않는다. 물론 책은 책꽂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바닥에 쌓아둘 수도, 상자에 담아 다락 한구석에 치워놓을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책이 아니라 짐에 가깝겠지만 어쨌든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아무리 튼튼한 책 탑을 쌓는다 한들, 이렇게 쌓은 탑에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 맨 밑바닥에 깔린 책을 꺼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탑을 해체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할까? 낮은 탑을 여러 개 쌓는다면 어떨까? 그런데, 그렇다면, 책등에 적힌 책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일이 허리를 굽혀가면서 확인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야 우리는 책꽂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벽에 달린 수평 선반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책이 존재하는 곳 어디서나 볼 수 있는 5단 책장 같은 보편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책에 가려 보이지 않았거나 볼 생각도 않았던 부분을 그제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책꽂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진을 찍을 때 뒷줄에 선 이들이 밟고 올라선 계단처럼, 거기 있지만 없는 것이다. 책꽂이는 책을 진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 혹은 책을 전시하기 위한 액자 틀 같은 것이지 서재, 서점, 도서관 등에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서재에서든 도서관에서든 더 많은 책을 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방법을 찾는 분투 속에서 책꽂이의 형태가 바뀌고, 책꽂이가 놓이는 방식이 바뀌고, 그리하여 책의 형태까지도 바뀌게 된 역사는 (책꽂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존재했지만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것처럼 희미해졌다.
《책이 사는 세계》는 바로 이 책꽂이가 거쳐온 역사를 다룬다. 우리는 오늘날 책꽂이에 책을 꽂는 방식, 즉 책등이 책등 바깥을 향하도록 해서 수직으로 꽂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책을 다른 방식으로 꽂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일조차 드물지만, 책은 아주 오랫동안 두루마리 형태로 누워 잠들었으며, 긴 세월 사슬에 묶여 지냈다. 지금은 서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지만 선반 위에 표지가 보이도록 진열되기도 했으며, 책등이 책장 안쪽을 향해 꽂히기도 했다. 책등이 책장 바깥을 향하도록 꽂히게 된 다음에야 책은 등에 제 이름과 자신을 집필한 이의 이름을 적게 됐고, 일정한 크기와 길이로 장정하게 됐다. 우리가 지금처럼 책을 색깔이나 길이에 맞춰, 혹은 다른 어떤 기준에 맞춰 책장에 아름답게 꽂아둘 수 있는 것은 책 자체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책꽂이의 변화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책꽂이는 책을 보관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책꽂이는 책의 형식을, 우리가 책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들었다고.
목차
1장 보이지 않는 책꽂이
2장 두루마리에서 코덱스로
3장 궤, 회랑, 열람실
4장 사슬에 묶인 책
5장 더 완벽한 책장
6장 책등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7장 빛이냐, 책을 꽂을 공간이냐
8장 완벽하게 장정된 책이 서점에 진열되다
9장 서고를 지탱하는 것들
10장 책들의 묘지
11장 장서의 과거와 미래
부록: 책을 배열하는 온갖 방법
책을 옮기고 나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