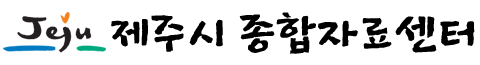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547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547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알라딘 북펀드 500%를 달성한 화제의 책!
나무와 친해지려면 그 이름부터.
나무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 나무는 이름이 뭔가요?” 사람들이 나무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나무 이름을 알게 되면? 바로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사람들은 왜 나무의 이름을 궁금해 할까요? 나무의 이름이 나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알아가는 출발점도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궁궐의 우리 나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무와 친해지는 즐거움을 전해온 박상진 교수가 이번에는 500여 종에 달하는 나무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유래와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 《우리 나무 이름 사전》을 펴냈습니다.
나무의 생태는 물론 전통문화와 우리말까지
나무의 이름은 잎·꽃·열매 등의 생김새나 색깔에 따라 붙기도 하고, 자라는 곳, 생태, 쓰임새에 따라서 붙기도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써왔을 우리말도 있고, 한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순우리말 이름은 평생 열매를 먹고, 껍질을 벗겨 생필품을 만드는 등 나무와 함께 살았을 평범한 사람들이 지었을 것이고, 한자로 된 이름은 한문과 친숙한 선비 등이 지었을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단어가 붙은 경우도 많습니다. 라틴어 학명이 그대로 나무 이름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서로 뒤섞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유래를 알기 어려운 이름도 많습니다. 나무 이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레 만들어지고, 또 변해왔기 때문이죠. 박상진 교수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우리말, 수백 년 전의 옛 문헌,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방언 등을 아우르는 넓은 지식으로 나무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나도밤나무는 남부 지방의 숲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다. 밤나무와는 전혀 다른 나무인데, 잎을 보면 왜 나도밤나무가 되었는지 이해가 간다. 밤나무 잎보다 크고 잎맥이 많기는 하지만 무척 닮았기 때문이다.” - 나도밤나무
“구상나무의 새싹이 돋아날 때나 암꽃이 필 때의 모습은 제주에 흔한 성게의 가시를 떠올리게 한다. 성게를 제주 방언으로 ‘쿠살’이라고 하는데, 구상나무를 처음에는 쿠살을 닮은 나무라는 뜻으로 ‘쿠살낭’이라고 부르다가 구상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 - 구상나무
“배롱나무의 꽃은 여름에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계속해서 핀다. 석 달 열흘, 즉 백 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꽃 하나하나가 계속 피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 지기를 반복하여 이어달리기로 계속 피는데, 꽃이 홍자색인 경우가 많아 백일홍(百日紅)이라고 한다. ‘나무’를 붙여 처음에는 ‘백일홍나무’로 부르다가 배롱나무가 되었다.”
나무 이름에 담긴 한중일 삼국의 교류와 역사
우리 땅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라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나무들은 같은 이름을 공유합니다. 특히 은행(銀杏)나무, 등(藤)나무처럼 한자로 된 이름은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읽는 법은 달라도 같은 한자를 쓰는 때도 많습니다. 일본은 가시나무를 ‘가시’라고 부르고, 느릅나무는 ‘니레’라고 불러 우리 이름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어져 이름이 붙은 예도 있지만,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붙은 이름엔 아픈 역사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한동안 소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던 적송(赤松)이란 이름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나무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그 직후였기에, 일본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더 고민할 문제입니다.
“적송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선 소나무의 일본 이름 아카마쓰(赤松)의 한자 표기로 들어와 일제강점기부터 쓰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대한제국 융희 4년(1910) 봄,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농상공부 고시 9호로 〈화한한명대조표(和韓漢名對照表)〉를 공시한다. 국권을 빼앗긴 것이 그해 8월이니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이다. 〈화한한명대조표〉에는 일본어(和)·우리말(韓)·한자(漢)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소나무란 우리 이름 대신에 일본 이름인 적송을 쓰라고 강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소나무
“비자나무가 주로 남해안 및 섬에서 자라는 데 비하여 개비자나무는 중부 지방의 숲속에서 자라며, 비자나무는 아름드리 큰 나무인데 개비자나무는 작은 나무이다. 과(科)도 다르다. 비자나무와 비교하여 ‘개’가 붙은 것은 개비자나무로서는 억울한 일인데, 일본 이름 이누가야(犬榧)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 개비자나무
서로 달라져가는 남과 북의 나무 이름
우리 나무 이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나무 이름입니다.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북한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언어에서도 차이가 생기고 있으며, 나무 이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우 여전히 같은 이름을 쓰거나, 약간만 달라진 정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차차 차이를 인식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무 이름 사전》의 마지막에는 북한은 나무 이름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정리해가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북한은 백당나무를 접시꽃나무라고 부르고, 오죽을 검정대라고 부르는 식으로 대체로 한자어 이름을 순우리말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니어서 히어리를 조선납판나무로 부르는 것처럼 반대인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부르는 나무 이름 200여 종을 정리해 표로 실었습니다.
나무와 친해지려면 그 이름부터.
나무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 나무는 이름이 뭔가요?” 사람들이 나무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나무 이름을 알게 되면? 바로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사람들은 왜 나무의 이름을 궁금해 할까요? 나무의 이름이 나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알아가는 출발점도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궁궐의 우리 나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무와 친해지는 즐거움을 전해온 박상진 교수가 이번에는 500여 종에 달하는 나무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유래와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 《우리 나무 이름 사전》을 펴냈습니다.
나무의 생태는 물론 전통문화와 우리말까지
나무의 이름은 잎·꽃·열매 등의 생김새나 색깔에 따라 붙기도 하고, 자라는 곳, 생태, 쓰임새에 따라서 붙기도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써왔을 우리말도 있고, 한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순우리말 이름은 평생 열매를 먹고, 껍질을 벗겨 생필품을 만드는 등 나무와 함께 살았을 평범한 사람들이 지었을 것이고, 한자로 된 이름은 한문과 친숙한 선비 등이 지었을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단어가 붙은 경우도 많습니다. 라틴어 학명이 그대로 나무 이름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서로 뒤섞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유래를 알기 어려운 이름도 많습니다. 나무 이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레 만들어지고, 또 변해왔기 때문이죠. 박상진 교수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우리말, 수백 년 전의 옛 문헌,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방언 등을 아우르는 넓은 지식으로 나무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나도밤나무는 남부 지방의 숲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다. 밤나무와는 전혀 다른 나무인데, 잎을 보면 왜 나도밤나무가 되었는지 이해가 간다. 밤나무 잎보다 크고 잎맥이 많기는 하지만 무척 닮았기 때문이다.” - 나도밤나무
“구상나무의 새싹이 돋아날 때나 암꽃이 필 때의 모습은 제주에 흔한 성게의 가시를 떠올리게 한다. 성게를 제주 방언으로 ‘쿠살’이라고 하는데, 구상나무를 처음에는 쿠살을 닮은 나무라는 뜻으로 ‘쿠살낭’이라고 부르다가 구상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 - 구상나무
“배롱나무의 꽃은 여름에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계속해서 핀다. 석 달 열흘, 즉 백 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꽃 하나하나가 계속 피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 지기를 반복하여 이어달리기로 계속 피는데, 꽃이 홍자색인 경우가 많아 백일홍(百日紅)이라고 한다. ‘나무’를 붙여 처음에는 ‘백일홍나무’로 부르다가 배롱나무가 되었다.”
나무 이름에 담긴 한중일 삼국의 교류와 역사
우리 땅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라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나무들은 같은 이름을 공유합니다. 특히 은행(銀杏)나무, 등(藤)나무처럼 한자로 된 이름은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읽는 법은 달라도 같은 한자를 쓰는 때도 많습니다. 일본은 가시나무를 ‘가시’라고 부르고, 느릅나무는 ‘니레’라고 불러 우리 이름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어져 이름이 붙은 예도 있지만,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붙은 이름엔 아픈 역사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한동안 소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던 적송(赤松)이란 이름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나무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그 직후였기에, 일본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더 고민할 문제입니다.
“적송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선 소나무의 일본 이름 아카마쓰(赤松)의 한자 표기로 들어와 일제강점기부터 쓰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대한제국 융희 4년(1910) 봄,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농상공부 고시 9호로 〈화한한명대조표(和韓漢名對照表)〉를 공시한다. 국권을 빼앗긴 것이 그해 8월이니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이다. 〈화한한명대조표〉에는 일본어(和)·우리말(韓)·한자(漢)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소나무란 우리 이름 대신에 일본 이름인 적송을 쓰라고 강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소나무
“비자나무가 주로 남해안 및 섬에서 자라는 데 비하여 개비자나무는 중부 지방의 숲속에서 자라며, 비자나무는 아름드리 큰 나무인데 개비자나무는 작은 나무이다. 과(科)도 다르다. 비자나무와 비교하여 ‘개’가 붙은 것은 개비자나무로서는 억울한 일인데, 일본 이름 이누가야(犬榧)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 개비자나무
서로 달라져가는 남과 북의 나무 이름
우리 나무 이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나무 이름입니다.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북한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언어에서도 차이가 생기고 있으며, 나무 이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우 여전히 같은 이름을 쓰거나, 약간만 달라진 정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차차 차이를 인식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무 이름 사전》의 마지막에는 북한은 나무 이름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정리해가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북한은 백당나무를 접시꽃나무라고 부르고, 오죽을 검정대라고 부르는 식으로 대체로 한자어 이름을 순우리말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니어서 히어리를 조선납판나무로 부르는 것처럼 반대인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부르는 나무 이름 200여 종을 정리해 표로 실었습니다.
목차
머리말-이름으로 만나는 나무 세상
ㄱ / ㄴ / ㄷ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ㅌ / ㅍ / ㅎ
나무 이름의 종류와 구성 방식
북한의 나무 이름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