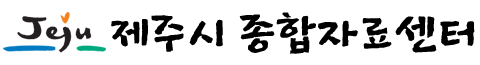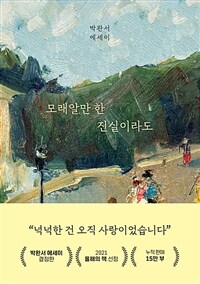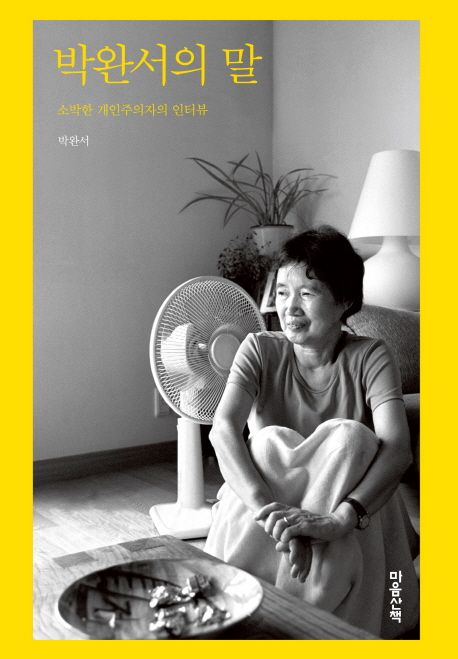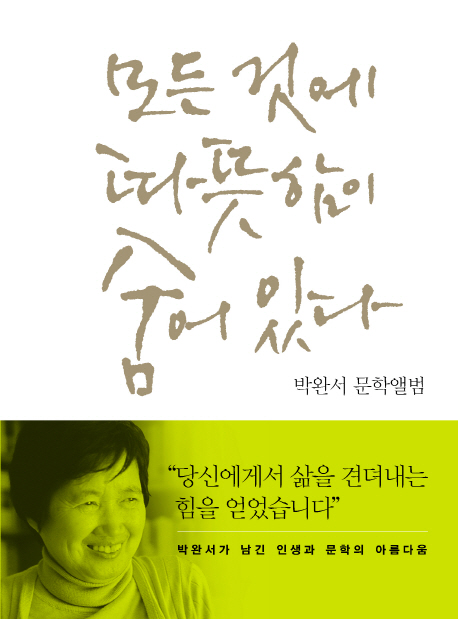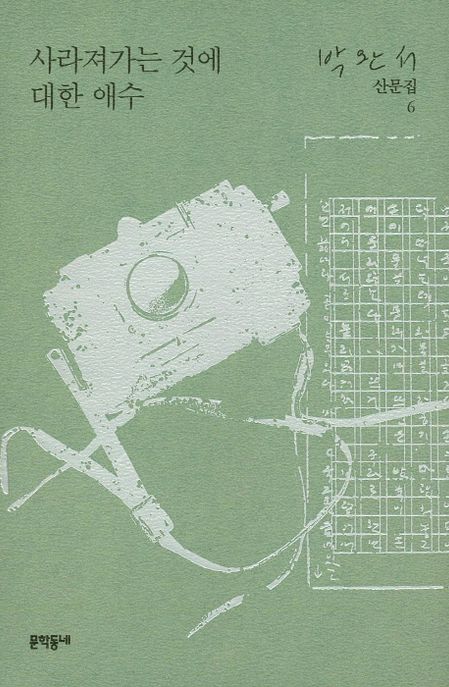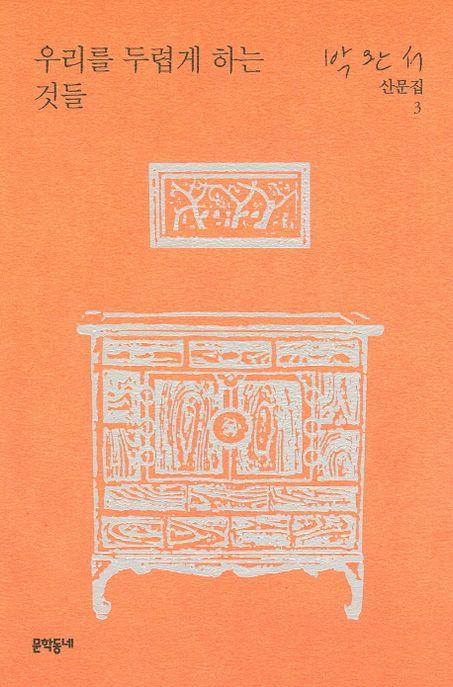
일반자료박완서 산문집 3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 저자/역자
- 박완서 지음
- 펴낸곳
- 문학동네
- 발행년도
- 2015
- 형태사항
- 312p.; 20cm
- 총서사항
- 박완서 산문집; 3
- ISBN
- 9788954634557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814.6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2651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265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그리운 이름, 박완서
살아 있는 목소리로 다시 만나다!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생생한 경험담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눈, 소소한 일상에서의 아기자기한 이야기까지-
2011년 1월 22일, 한국 문단은 소중한 작가 박완서를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잠겼었다. 1931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과 한국전쟁, 남북분단 등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었던 박완서 작가는 1970년 불혹의 나이에 문단에 데뷔하여 2011년 영면에 들기까지 40여 년간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다. 2015년,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째를 맞았다. 더이상 그의 신작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가 40여 년간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완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는 작가가 되었다. 하여 해마다 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소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완서 작가 4주기에 맞춰 발간된 그의 초기 산문집 일곱 권도 그렇게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다.
더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는 작가 박완서는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한 산문들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77년 평민사에서 출간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시작으로 박완서 작가는 꾸준히 산문집을 출간했다. 각각의 책에는 그의 작품 이면에 숨겨진 인간 박완서의 삶과 어머니이자 아내,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 오롯이 담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소설과는 또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한다.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출간된 박완서 산문집은 그의 첫 산문집을 포함한 초기 산문집 일곱 권이다. 1977년 출간된 첫 산문집을 시작으로 1990년까지 박완서 작가가 펴낸 것으로서, 초판 당시의 원본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글을 추리고 재편집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각각의 제목은 1권 『쑥스러운 고백』, 2권 『나의 만년필』, 3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4권 『살아 있는 날의 소망』, 5권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가』, 6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7권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이다. 당시와 한글 맞춤법이 많이 바뀌어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수정을 하였지만, 박완서 작가 특유의 입말을 생생하게 살리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은 그대로 살렸다. 그러나 수록된 산문에서도 드러나거니와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바른 말 쓰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작가인지라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을뿐더러 그 시간의 차이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온다. 특히 박완서 작가의 맏딸 호원숙 수필가가 일곱 권의 산문집이 새롭게 독자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출간 과정을 함께했다.
한편, 각각의 표지를 장식하는 이미지들은 이병률 시인과 박완서 작가의 손녀 김지상씨가 사진으로 찍은 박완서 작가의 유품이다. 이로써 안에 담긴 내용뿐 아니라 새로 차려입은 새옷에 담긴 그 의미까지 더욱 풍성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일곱 권의 산문집이 반가운 이유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인 현재의 우리들에게 이 책을 통해 마치 박완서 작가가 살아 있는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것 같아서가 아닐까.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작가의 생생한 경험담과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는 냉철한 눈, 작가로서 또는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가지는 소소한 일상에서의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일곱 권의 산문집은, 길게는 40년 가까운 시간이, 짧게는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2015년 현재에도 유효할 뿐 아니라 여전히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타인의 고통을 참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으랴”
박완서 산문집 3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다. 1978년 출간된 『남자와 여자가 있는 풍경』을 재편집한 것이다. 여행길에 우연히 들른 소록도에서 환자의 목발 소리를 새소리로 오해한 「소록도의 새소리」처럼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글들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2부 작가의 슬픔’에서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 속에서 또한 작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솔직한 고민과 광복과 한국전쟁의 기억을 생생한 체험으로 들려준다.
다소 짧은 산문들이 실려 있는 4부에서는 짧은 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박완서 작가의 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저만치서 목발을 짚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소록도에서 만난 최초의 환자였다. 멀리서도 단박 환자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외양을 하고 있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너무 주목해도 안 되고, 불쾌한 눈치를 보이며 피해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보통 행인과 엇갈리듯이 자연스럽게 엇갈려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얼굴이 자연스럽지 못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여자가 좀더 가까워졌다. 그때 숲에서 맑고 드높은 새소리가 들렸다. 새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좀더 커졌다.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탄성을 질렀다.
“얘들아! 저 새소리 좀 들어보렴, 무슨 새일까?”
그러나 딸애들은 이상하게 난처한 얼굴을 하고 내 탄성을 못들은 척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우리와 엇갈리고 멀어져갔다. 새소리도 은은하게 멀어져갔다. 그제야 아이들이 나를 핀잔주었다.
“엄마도 참 주책이셔. 새소린 무슨 새소리예요? 저 환자 목발에서 나는 소리였단 말예요.”
이런 때 무슨 변명을 시도했다간 더 주책 노릇 되고 만다._「소록도의 새소리」 중에서
살아 있는 목소리로 다시 만나다!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생생한 경험담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눈, 소소한 일상에서의 아기자기한 이야기까지-
2011년 1월 22일, 한국 문단은 소중한 작가 박완서를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잠겼었다. 1931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과 한국전쟁, 남북분단 등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었던 박완서 작가는 1970년 불혹의 나이에 문단에 데뷔하여 2011년 영면에 들기까지 40여 년간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다. 2015년,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째를 맞았다. 더이상 그의 신작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가 40여 년간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완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는 작가가 되었다. 하여 해마다 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소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완서 작가 4주기에 맞춰 발간된 그의 초기 산문집 일곱 권도 그렇게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다.
더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는 작가 박완서는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한 산문들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77년 평민사에서 출간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시작으로 박완서 작가는 꾸준히 산문집을 출간했다. 각각의 책에는 그의 작품 이면에 숨겨진 인간 박완서의 삶과 어머니이자 아내,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 오롯이 담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소설과는 또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한다.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출간된 박완서 산문집은 그의 첫 산문집을 포함한 초기 산문집 일곱 권이다. 1977년 출간된 첫 산문집을 시작으로 1990년까지 박완서 작가가 펴낸 것으로서, 초판 당시의 원본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글을 추리고 재편집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각각의 제목은 1권 『쑥스러운 고백』, 2권 『나의 만년필』, 3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4권 『살아 있는 날의 소망』, 5권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가』, 6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7권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이다. 당시와 한글 맞춤법이 많이 바뀌어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수정을 하였지만, 박완서 작가 특유의 입말을 생생하게 살리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은 그대로 살렸다. 그러나 수록된 산문에서도 드러나거니와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바른 말 쓰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작가인지라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을뿐더러 그 시간의 차이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온다. 특히 박완서 작가의 맏딸 호원숙 수필가가 일곱 권의 산문집이 새롭게 독자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출간 과정을 함께했다.
한편, 각각의 표지를 장식하는 이미지들은 이병률 시인과 박완서 작가의 손녀 김지상씨가 사진으로 찍은 박완서 작가의 유품이다. 이로써 안에 담긴 내용뿐 아니라 새로 차려입은 새옷에 담긴 그 의미까지 더욱 풍성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일곱 권의 산문집이 반가운 이유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인 현재의 우리들에게 이 책을 통해 마치 박완서 작가가 살아 있는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것 같아서가 아닐까.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작가의 생생한 경험담과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는 냉철한 눈, 작가로서 또는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가지는 소소한 일상에서의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일곱 권의 산문집은, 길게는 40년 가까운 시간이, 짧게는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2015년 현재에도 유효할 뿐 아니라 여전히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타인의 고통을 참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으랴”
박완서 산문집 3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다. 1978년 출간된 『남자와 여자가 있는 풍경』을 재편집한 것이다. 여행길에 우연히 들른 소록도에서 환자의 목발 소리를 새소리로 오해한 「소록도의 새소리」처럼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글들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2부 작가의 슬픔’에서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 속에서 또한 작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솔직한 고민과 광복과 한국전쟁의 기억을 생생한 체험으로 들려준다.
다소 짧은 산문들이 실려 있는 4부에서는 짧은 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박완서 작가의 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저만치서 목발을 짚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소록도에서 만난 최초의 환자였다. 멀리서도 단박 환자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외양을 하고 있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너무 주목해도 안 되고, 불쾌한 눈치를 보이며 피해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보통 행인과 엇갈리듯이 자연스럽게 엇갈려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얼굴이 자연스럽지 못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여자가 좀더 가까워졌다. 그때 숲에서 맑고 드높은 새소리가 들렸다. 새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좀더 커졌다.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탄성을 질렀다.
“얘들아! 저 새소리 좀 들어보렴, 무슨 새일까?”
그러나 딸애들은 이상하게 난처한 얼굴을 하고 내 탄성을 못들은 척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우리와 엇갈리고 멀어져갔다. 새소리도 은은하게 멀어져갔다. 그제야 아이들이 나를 핀잔주었다.
“엄마도 참 주책이셔. 새소린 무슨 새소리예요? 저 환자 목발에서 나는 소리였단 말예요.”
이런 때 무슨 변명을 시도했다간 더 주책 노릇 되고 만다._「소록도의 새소리」 중에서
목차
1부 작은 손을 위한 나의 소망
작은 손을 위한 나의 소망 | 소록도의 새소리 | 은행나무와 대머리 | 꿈 | 자연으로 혼자 떠나라 | 회엘레 잔치의 회상 | 한겨울의 출분出奔 | 삶의 가을과 계절의 가을의 만남
2부 작가의 슬픔
작가의 슬픔 | 자유인에 대하여 | 열다섯 살의 8월 15일 | 다시 유월에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3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름에 대하여 | 어느 우울한 아침 | 건망증의 시대에 살면서 |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 예전 맛 신식 맛 | 효도관광 | 어느 여성 근로자와의 이야기
4부 잔디를 심으며
어머니의 이야기 | 식구와 인구 | 요새 엄마 | 오월과 후레자식 | 여자와 남자 | 여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 남자가 남자다울 때 | 최근에 만난 빛나는 남성 | ‘여자가 더 좋아’에 대하여 | 꿈과 낭만이 억압받던 시절 | 자선과 위선의 사이 | 딸애와 자가용 합승 | 번데기 | 말의 폭력 | 장미의 기억 | 겨울 바다 | 잔디를 심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