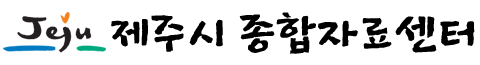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781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781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 존재에 대한 섬찟할 만큼 아름다운 시선
김초엽 신작 장편소설
“나는 너의 일부가 될 거야. 너는 나를 기억하는 대신 감각할 거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함께 잊어버리자.”
김초엽의 신작 장편소설 『파견자들』이 출간되었다. ‘더스트’라는 절망으로 물든 세계, 푸른빛을 발하는 덩굴식물 ‘모스바나’, 미약해 보이나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15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첫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2021) 이후 두번째 장편소설이다. 한 식물생태학자가 모스바나의 비밀을 추적해가던 이야기가 세계의 재건과 구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 도달할 때의 놀라운 충격과 깊은 감동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이 소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작가가 써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가진 이야기를.
『파견자들』은 어느 겨울, 한 가정집으로 입양된 여자아이가 쓴 수상한 쪽지에서 출발한다. 여자아이는 낯선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 채,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보낼 수 없는 편지만 쓸 뿐이다. 집안의 어른들은 울다 지쳐 잠든 여자아이의 방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쪽지를 발견한다.
“나는 너의 일부가 될 거야. 어떤 기억은 뇌가 아니라 몸에 새겨질 거야. 너는 나를 기억하는 대신 감각할 거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함께 잊어버리자.”(<프롤로그>에서)
어린아이가 썼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의 쪽지 앞에서 어른들은 걱정에 잠긴다. 이 쪽지는 대체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까? 혹은 누군가의 말을 받아적은 메모인 걸까? 아주 천천히 정점(頂點)을 향해 올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김초엽은 독자를 데리고 다음 페이지로, 또 그다음 페이지로 나아간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꼭대기에 올라왔음을 깨닫는 순간, 독자들은 섬찟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의 풍경을 목도하며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SF 소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한계로 가득한 기존의 인식을 깨뜨리는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 속 인물과 함께 이를 탐구해나가는 장르라는 사실 말이다.
▶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를 전율케 하는 작가, 김초엽이 가닿은 절실하고도 경이로운 질문
“파견자는 매료와 증오를 동시에 품고 나아가는 직업입니다. 무언가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증오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광증을 퍼뜨리는 아포(芽胞)로 가득찬 지상 세계. 사람들은 어둡고 퀴퀴한 지하 도시로 떠밀려와 반쪽짜리 삶을 이어간다. 형편없는 음식에 만족하는 한편, 혹여라도 광증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하지만 태린은 누구보다 지상을 갈망한다. 그에게 일렁이는 노을의 황홀한 빛깔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반짝임을 알려준 스승 이제프 때문이다. 태린은 이제프처럼 파견자가 되어 그와 함께 지상을 탐사하기를 원한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이제프에게 더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리숙한 제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 설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파견자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필요 과정을 이수해가는 동안, 태린은 다른 이들처럼 기억 보조 장치인 뉴로브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늦은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머릿속에서 뉴로브릭과의 연결을 끊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광증 저항성을 발휘하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파견자 자격 시험만을 앞둔 상황. 그런 태린에게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소년 같기도 하고, 소녀 같기도 한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일까, 이제프의 말처럼 뉴로브릭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일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 광증에 걸려 미치기라도 한 걸까? 태린은 그 목소리를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반응하면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시험에 다다른다. 지상으로 나간 태린은, 마치 유화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화려한 색채로 빛나는 풍경에 압도된다. 인간의 자아를 파괴하는 범람체들의 세계는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린은 파견자란 지상을 향한 매혹뿐 아니라, 증오까지 함께 품어야 한다는 이제프의 조언을 되새기며 목적지를 향해 한걸음씩 내디딘다. 멈추지 않고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와 함께.
▶ 식물의 세계에서 균류의 세계로
“인간의 감각적 자원이 그것을 상상하기에 얼마나 모자란지를 새삼 느꼈지만, 꼭 한 번쯤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
김초엽은 몇 년 전 한 미술 전시에 발표한 짧은 이야기를 씨앗 삼아 이를 긴 호흡의 장편소설 『파견자들』로 탄생시켰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된 존재인지 살피고, 이를 통해 인간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 탐구한다. 그가 자신만의 탐구 과정과 답안을 고민하며 이번에 몰두한 것은 곰팡이와 버섯 등의 생물을 포함하는 ‘균류’다. 분해하고 부패해가는 모든 과정과 결과물들, 달큰하면서도 속을 울렁이게 만드는 냄새 등으로 떠올려지는 어떤 존재 말이다. 균류를 모델로 소설 속의 ‘범람체’를 고안해낸 그는, “인간의 감각적 자원이 그것을 상상하기에 얼마나 모자란지를 새삼 느꼈지만, 꼭 한 번쯤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작가의 말)고 말한다.
『파견자들』은 우주로부터 불시착한 먼지들 때문에 낯선 행성으로 변해버린 지구, 그곳을 탐사하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목격하는 파견자들의 이야기다. 이때 파견자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시험을 거치며 지상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독자가 도달하는 곳은 김초엽의 소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리라. 당신은 이 풍경 앞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그 느낌이 당신 자신에 대한 상상과 이 세계에 대한 시각을 얼마쯤은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계속해서 스스로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고 갱신해가는 이 놀라운 소설가의 바람은 아마 그뿐일 터다.
김초엽 신작 장편소설
“나는 너의 일부가 될 거야. 너는 나를 기억하는 대신 감각할 거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함께 잊어버리자.”
김초엽의 신작 장편소설 『파견자들』이 출간되었다. ‘더스트’라는 절망으로 물든 세계, 푸른빛을 발하는 덩굴식물 ‘모스바나’, 미약해 보이나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15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첫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2021) 이후 두번째 장편소설이다. 한 식물생태학자가 모스바나의 비밀을 추적해가던 이야기가 세계의 재건과 구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 도달할 때의 놀라운 충격과 깊은 감동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이 소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작가가 써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가진 이야기를.
『파견자들』은 어느 겨울, 한 가정집으로 입양된 여자아이가 쓴 수상한 쪽지에서 출발한다. 여자아이는 낯선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 채,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보낼 수 없는 편지만 쓸 뿐이다. 집안의 어른들은 울다 지쳐 잠든 여자아이의 방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쪽지를 발견한다.
“나는 너의 일부가 될 거야. 어떤 기억은 뇌가 아니라 몸에 새겨질 거야. 너는 나를 기억하는 대신 감각할 거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함께 잊어버리자.”(<프롤로그>에서)
어린아이가 썼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의 쪽지 앞에서 어른들은 걱정에 잠긴다. 이 쪽지는 대체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까? 혹은 누군가의 말을 받아적은 메모인 걸까? 아주 천천히 정점(頂點)을 향해 올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김초엽은 독자를 데리고 다음 페이지로, 또 그다음 페이지로 나아간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꼭대기에 올라왔음을 깨닫는 순간, 독자들은 섬찟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의 풍경을 목도하며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SF 소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한계로 가득한 기존의 인식을 깨뜨리는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 속 인물과 함께 이를 탐구해나가는 장르라는 사실 말이다.
▶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를 전율케 하는 작가, 김초엽이 가닿은 절실하고도 경이로운 질문
“파견자는 매료와 증오를 동시에 품고 나아가는 직업입니다. 무언가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증오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광증을 퍼뜨리는 아포(芽胞)로 가득찬 지상 세계. 사람들은 어둡고 퀴퀴한 지하 도시로 떠밀려와 반쪽짜리 삶을 이어간다. 형편없는 음식에 만족하는 한편, 혹여라도 광증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하지만 태린은 누구보다 지상을 갈망한다. 그에게 일렁이는 노을의 황홀한 빛깔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반짝임을 알려준 스승 이제프 때문이다. 태린은 이제프처럼 파견자가 되어 그와 함께 지상을 탐사하기를 원한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이제프에게 더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리숙한 제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 설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파견자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필요 과정을 이수해가는 동안, 태린은 다른 이들처럼 기억 보조 장치인 뉴로브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늦은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머릿속에서 뉴로브릭과의 연결을 끊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광증 저항성을 발휘하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파견자 자격 시험만을 앞둔 상황. 그런 태린에게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소년 같기도 하고, 소녀 같기도 한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일까, 이제프의 말처럼 뉴로브릭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일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 광증에 걸려 미치기라도 한 걸까? 태린은 그 목소리를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반응하면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시험에 다다른다. 지상으로 나간 태린은, 마치 유화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화려한 색채로 빛나는 풍경에 압도된다. 인간의 자아를 파괴하는 범람체들의 세계는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린은 파견자란 지상을 향한 매혹뿐 아니라, 증오까지 함께 품어야 한다는 이제프의 조언을 되새기며 목적지를 향해 한걸음씩 내디딘다. 멈추지 않고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와 함께.
▶ 식물의 세계에서 균류의 세계로
“인간의 감각적 자원이 그것을 상상하기에 얼마나 모자란지를 새삼 느꼈지만, 꼭 한 번쯤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
김초엽은 몇 년 전 한 미술 전시에 발표한 짧은 이야기를 씨앗 삼아 이를 긴 호흡의 장편소설 『파견자들』로 탄생시켰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된 존재인지 살피고, 이를 통해 인간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 탐구한다. 그가 자신만의 탐구 과정과 답안을 고민하며 이번에 몰두한 것은 곰팡이와 버섯 등의 생물을 포함하는 ‘균류’다. 분해하고 부패해가는 모든 과정과 결과물들, 달큰하면서도 속을 울렁이게 만드는 냄새 등으로 떠올려지는 어떤 존재 말이다. 균류를 모델로 소설 속의 ‘범람체’를 고안해낸 그는, “인간의 감각적 자원이 그것을 상상하기에 얼마나 모자란지를 새삼 느꼈지만, 꼭 한 번쯤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작가의 말)고 말한다.
『파견자들』은 우주로부터 불시착한 먼지들 때문에 낯선 행성으로 변해버린 지구, 그곳을 탐사하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목격하는 파견자들의 이야기다. 이때 파견자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시험을 거치며 지상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독자가 도달하는 곳은 김초엽의 소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리라. 당신은 이 풍경 앞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그 느낌이 당신 자신에 대한 상상과 이 세계에 대한 시각을 얼마쯤은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계속해서 스스로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고 갱신해가는 이 놀라운 소설가의 바람은 아마 그뿐일 터다.
목차
프롤로그
1부
2부
연구 일지
3부
에필로그
작가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