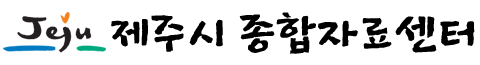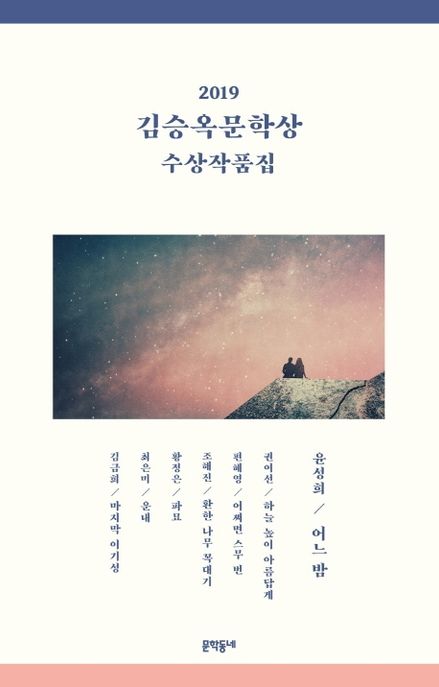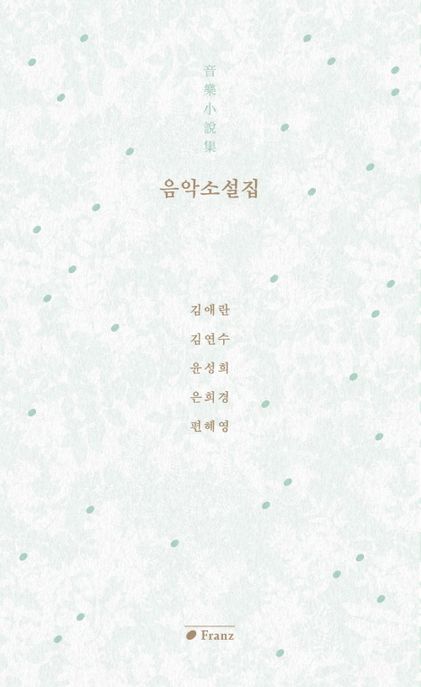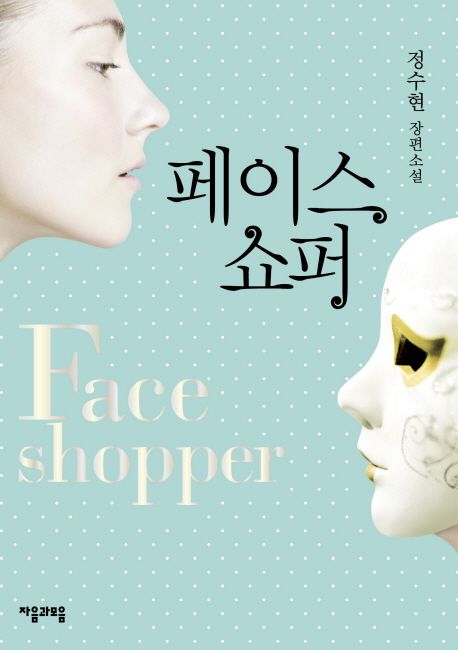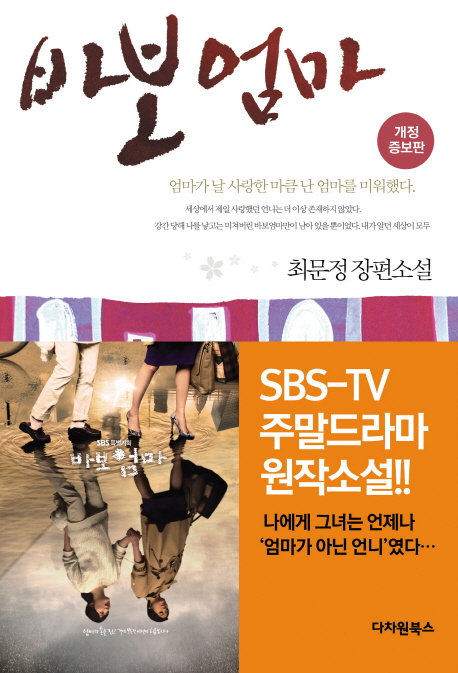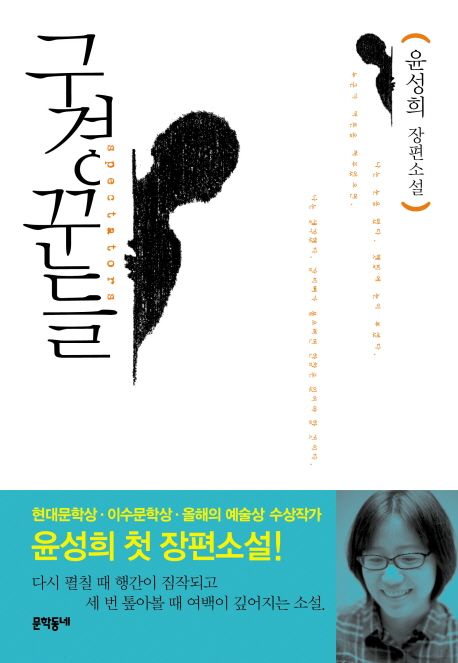
일반자료문학동네 장편소설
구경꾼들
Spectators
- 저자/역자
- 윤성희 지음
- 펴낸곳
- 문학동네
- 발행년도
- 2010
- 형태사항
- 309 p.; 22 cm
- 총서사항
- 문학동네 장편소설
- ISBN
- 9788954612807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813.6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0161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016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그리고 마침내 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세상 저편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현대문학상 이수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가
윤성희 첫 장편소설 『구경꾼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윤성희가 첫 장편을 선보인다. 등단한 지 만 십일 년, 그동안 세 권의 소설집을 묶어냈으니 그는 거의 매 계절 쉬지 않고 새로운 단편을 선보여온 셈이고, 발표하는 한 편 한 편 독자를 만족시켜왔다. 그만큼 독자들은 작가의 장편을 기다려왔을 터이다. 그가, 드디어, 첫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최근에 저는 삶이란 이런저런 것들을 쳐다보고 그냥 어리둥절해하는 일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또 오죽할까요. (……) 삶은 언제나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그 단어에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작가들은 그 단어들을 초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것들을 쳐다보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리둥절해하기로 했습니다. 미로를 헤매다보면 뭔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겠지요.
처음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는 그렇게 입을 열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말은 아니겠으나,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윤성희의 첫 장편 『구경꾼들』은 그 어떤 작품들보다도 그 빈 공간, 우리의 삶과 글자로 표현된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듯하다.
모두에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그의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보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야기’가 있었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 대문자역사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여나가는 이들뿐 아니라, 별볼일없어 보이는 소소한 일상을 겨우겨우 버티어나가고 있는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살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소설의 주인공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들로 삼아서도, 그 주인공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서도, 그의 소설이 평범한 일상을 새삼 들추어내고 의미를 부여해서도 아니다. 윤성희는 실제로 (주인공뿐 아니라) 소설 속 모든 인물들에 저마다의 이야기를 선사한다. ‘이야기’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것이 아닌 것이다.
해서, 이야기들은 자꾸 뻗어나간다. 윤성희의 소설엔 수많은 가지들이 새롭게 돋아난다. 하나의 줄기에서 출발한 이야기에서 새 가지들이 돋고, 그 돋아난 가지에서 또다시 새로운 가지들이 돋아나, 서로 곁을 기대고 엉키어 더없이 풍요로운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설은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행과 행 사이, 우리가 잠깐 숨을 쉬는 그 빈 공간에서도 새로워진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태어난다. 해서 모두가 주인공이며 또한 ‘구경꾼들’이 되는 그 자리에, 그의 소설이 있다.
다시 펼칠 때 행간이 짐작되고 세 번 톺아볼 때 여백이 깊어지는 소설
한 장의 가족사진. 여덟 명의 사진 속에 그 몇 곱의 사람들이 지나온 자취가 포개져 있는 사진. 한 자리, 한자리, 비워진 자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간직되는 사진. 수십 통의 편지 수백 통의 엽서 이편과 저편의 삶이 이어져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이야! 기. 지구 반대편을 찾아 헤맨 끝에 지금 여기서 만나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수천 가지의 마음 상처 입은 이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보통 사람들의 온기. 서로를 궁금해 하면서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성숙한 배려. 떠난 사람이 남은 사람을, 오는 사람이 가는 사람을, 헤아리는 슬픔. 우리가 다하지 못한 사랑. 한 권의 소설 나를 스친 모든 인연을 그려보게 하는 소설. 살아온 터와 곁에 있는 사물들의 내력을 생각게 하는 소설. 가보지 못한 낯선 골목과 채 닿지 못한 마음들을 상상하게 하는 소설.
다시 펼칠 때 행간이 짐작되고 세 번 톺아볼 때 여백이 깊어지는 소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이 작은 우주에 이토록 많은 사연이 숨쉬고 있으니.
_차미령(문학평론가)
그의 소설에선 다른 반찬이 필요없는 갓 지은 흰 쌀밥 냄새가 난다. 이미 그 더운 밥냄새만으로도 허기를 채워주고, 꼭꼭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와 가난한 마음을 달래준다.
“다시 펼칠 때 행간이 짐작되고 세 번 톺아볼 때 여백이 깊어”진다는 차미령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다시 읽으라 권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다시 펼치게 되고, 새롭게 펼칠 때 이야기는 또다시 새 가지를 뻗는다. 한 그루 나무는 그 자체로 풍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씨를 퍼뜨린다.
나뿐만 아니라 이 소설 속의 ‘나’도 여전히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 부러진 갈비뼈는 영원히 붙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겨우 한 귀퉁이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나머지는 누가 보는 것일까? 그 나머지의 공간, 그 나머지의 경험,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어디를 떠돌게 되는 것일까? 나는 늘 그것이 궁금했다._‘작가의 말’ 중에서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작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 나머지의 공간, 그 나머지의 경험, 그 나머지의 떠도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독자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빈 공간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고맙다고.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마르케스는 말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기억해주고 새롭게 이야기해주는 그가 있어, 행복하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세상 저편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현대문학상 이수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가
윤성희 첫 장편소설 『구경꾼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윤성희가 첫 장편을 선보인다. 등단한 지 만 십일 년, 그동안 세 권의 소설집을 묶어냈으니 그는 거의 매 계절 쉬지 않고 새로운 단편을 선보여온 셈이고, 발표하는 한 편 한 편 독자를 만족시켜왔다. 그만큼 독자들은 작가의 장편을 기다려왔을 터이다. 그가, 드디어, 첫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최근에 저는 삶이란 이런저런 것들을 쳐다보고 그냥 어리둥절해하는 일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또 오죽할까요. (……) 삶은 언제나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그 단어에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작가들은 그 단어들을 초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것들을 쳐다보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리둥절해하기로 했습니다. 미로를 헤매다보면 뭔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겠지요.
처음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는 그렇게 입을 열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말은 아니겠으나,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윤성희의 첫 장편 『구경꾼들』은 그 어떤 작품들보다도 그 빈 공간, 우리의 삶과 글자로 표현된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듯하다.
모두에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그의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보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야기’가 있었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 대문자역사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여나가는 이들뿐 아니라, 별볼일없어 보이는 소소한 일상을 겨우겨우 버티어나가고 있는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살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소설의 주인공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들로 삼아서도, 그 주인공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서도, 그의 소설이 평범한 일상을 새삼 들추어내고 의미를 부여해서도 아니다. 윤성희는 실제로 (주인공뿐 아니라) 소설 속 모든 인물들에 저마다의 이야기를 선사한다. ‘이야기’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것이 아닌 것이다.
해서, 이야기들은 자꾸 뻗어나간다. 윤성희의 소설엔 수많은 가지들이 새롭게 돋아난다. 하나의 줄기에서 출발한 이야기에서 새 가지들이 돋고, 그 돋아난 가지에서 또다시 새로운 가지들이 돋아나, 서로 곁을 기대고 엉키어 더없이 풍요로운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설은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행과 행 사이, 우리가 잠깐 숨을 쉬는 그 빈 공간에서도 새로워진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태어난다. 해서 모두가 주인공이며 또한 ‘구경꾼들’이 되는 그 자리에, 그의 소설이 있다.
다시 펼칠 때 행간이 짐작되고 세 번 톺아볼 때 여백이 깊어지는 소설
한 장의 가족사진. 여덟 명의 사진 속에 그 몇 곱의 사람들이 지나온 자취가 포개져 있는 사진. 한 자리, 한자리, 비워진 자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간직되는 사진. 수십 통의 편지 수백 통의 엽서 이편과 저편의 삶이 이어져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이야! 기. 지구 반대편을 찾아 헤맨 끝에 지금 여기서 만나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수천 가지의 마음 상처 입은 이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보통 사람들의 온기. 서로를 궁금해 하면서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성숙한 배려. 떠난 사람이 남은 사람을, 오는 사람이 가는 사람을, 헤아리는 슬픔. 우리가 다하지 못한 사랑. 한 권의 소설 나를 스친 모든 인연을 그려보게 하는 소설. 살아온 터와 곁에 있는 사물들의 내력을 생각게 하는 소설. 가보지 못한 낯선 골목과 채 닿지 못한 마음들을 상상하게 하는 소설.
다시 펼칠 때 행간이 짐작되고 세 번 톺아볼 때 여백이 깊어지는 소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이 작은 우주에 이토록 많은 사연이 숨쉬고 있으니.
_차미령(문학평론가)
그의 소설에선 다른 반찬이 필요없는 갓 지은 흰 쌀밥 냄새가 난다. 이미 그 더운 밥냄새만으로도 허기를 채워주고, 꼭꼭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와 가난한 마음을 달래준다.
“다시 펼칠 때 행간이 짐작되고 세 번 톺아볼 때 여백이 깊어”진다는 차미령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다시 읽으라 권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다시 펼치게 되고, 새롭게 펼칠 때 이야기는 또다시 새 가지를 뻗는다. 한 그루 나무는 그 자체로 풍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씨를 퍼뜨린다.
나뿐만 아니라 이 소설 속의 ‘나’도 여전히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 부러진 갈비뼈는 영원히 붙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겨우 한 귀퉁이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나머지는 누가 보는 것일까? 그 나머지의 공간, 그 나머지의 경험,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어디를 떠돌게 되는 것일까? 나는 늘 그것이 궁금했다._‘작가의 말’ 중에서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작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 나머지의 공간, 그 나머지의 경험, 그 나머지의 떠도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독자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빈 공간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고맙다고.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마르케스는 말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기억해주고 새롭게 이야기해주는 그가 있어, 행복하다.
목차
구경꾼들
작가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