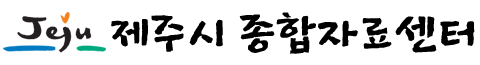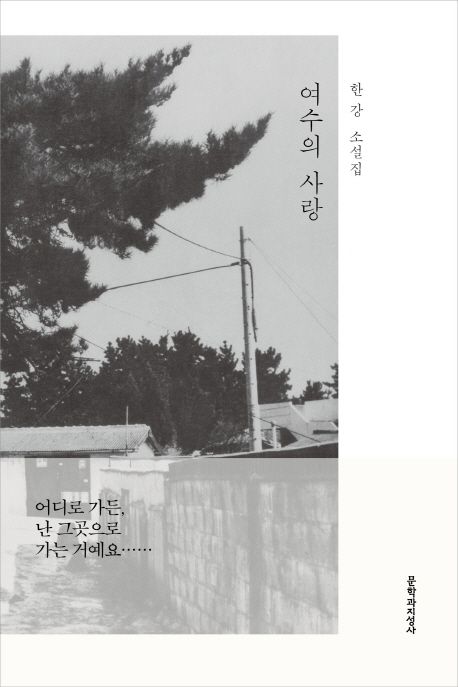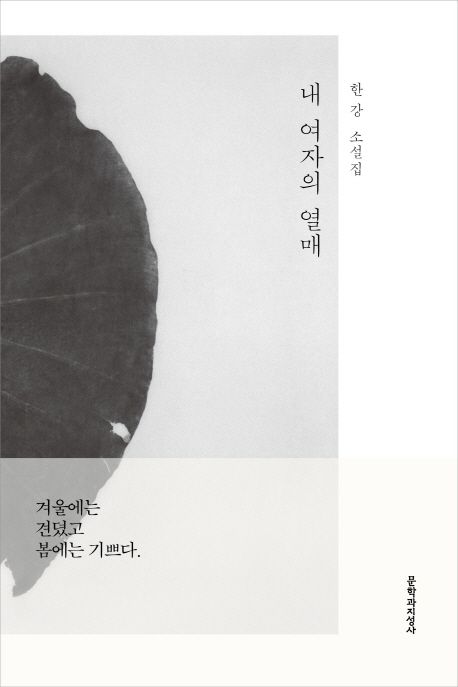일반자료
흰: 한강 소설
(The)elegy of whiteness
- 저자/역자
- 한강 지음 / 차미혜 사진
- 발행년도
- 2016
- 형태사항
- 129p.: 20cm
- ISBN
- 9788954640718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813.6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363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JG000000363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2016 한강 신작 소설
『흰』
사라질─사라지고 있는─아름다움……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
1.
작가 한강의 신작 소설을 선보입니다. 『흰』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겨울에 기획한 책. 2014년에 완성된 초고를 바탕으로 글의 매무새를 닳도록 만지고 또 어루만져서 2016년 5월인 오늘에야 간신히 꿰맬 수 있게 된 책. 수를 놓듯 땀을 세어가며 지은 책, 그런 땀방울로 얼룩진 책, 다행이라면 “얼룩이 지더라도 흰 얼룩이 더러운 얼룩보다 낫기에.”
이참이 아니라면 ‘흰’이라는 한 글자에 매달려 그가 파생시킨 세상 모든 ‘흰 것’들의 안팎을 헤집어볼 수가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흰’이라는 한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노라니 ‘흰’이라는 한 글자의 생김과 발음에서 끓어 넘친 숭늉처럼 찐득찐득한 슬픔 같은 게 밀려듭니다. ‘흰’, 익숙한 듯 편안했다가 낯선 듯 생경스러워지는 이 느낌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안다고 말할 수도, 또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기묘하고 미묘한 ‘흰’의 세계 속에서 한강이 끌어올린 서사는 놀라우리만치 넓고 깊습니다.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특유의 감각으로 예리하게 건져올린 사유는 얼음처럼 차갑고 막 빻아져 나온 뼛가루처럼 뜨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흰’에서 와서 ‘흰’으로 돌아가지 않던가요. 한강이 백지 위에 힘껏 눌러 쓴 소설 『흰』. 그 밖의 모든 흰 것을 말하는 소설 『흰』. 『흰』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작가로부터 불려나온 흰 것의 목록은 총 65개의 이야기로 파생되어 ‘나’와 ‘그녀’와 ‘모든 흰’이라는 세 개의 부 아래 스미어 있습니다. 한 권의 소설이지만 때론 65편의 시가 실린 한 권의 시집으로 읽힘에 손색이 없는 것이 각 소제목 아래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밀도 있는 완성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얇은 볼륨감을 가진 이 한 권의 소설은 쉽게 읽혀버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느릿느릿 읽게 하다가, 흐린 연필 한 자루를 들어 문장에 혹은 단어에 실금을 긋게 하다가, 다시금 앞서 읽은 페이지로 돌아가 그 앞선 데서부터 다시금 읽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멍울 같은 게 책장에 스미면서 점점 묵직해져가는 소설 『흰』의 무게감을 받치기 위해 불려나온 흰 것들. 예컨대 강보, 배내옷, 달떡, 안개, 흰 도시, 젖, 초, 성에, 서리, 각설탕, 흰 돌, 흰 뼈, 백발, 구름, 백열전구, 백야,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흰나비, 쌀과 밥, 수의, 소복, 연기, 아랫니, 눈, 눈송이들, 만년설, 파도, 진눈깨비, 흰 개, 눈보라, 재, 소금, 달, 레이스 커튼, 입김, 흰 새들, 손수건, 은하수, 백목련, 당의정…… 등등 온통 무참히도 흰 것들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발음해봅니다. 이 소설은 이렇듯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두 가지 과정 속에 불현듯 진정한 제 속내를 들켜주기도 한다지요. 흰 것을 떠올리고 불러내고 불러주고 글로 쓰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흰 것을 보고 흰 것을 읽는 우리를 치유시켜주는 일이 아닐까요. “환부에 바를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거즈”가 결국 한강이 말하고자 하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역할이자 또다른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닐까요.
3.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에 시달리는 ‘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은 제 어머니가 스물세 살에 낳았다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죽었다는 ‘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봄 누군가 나에게 물었지요. “당신이 어릴 때, 슬픔과 가까워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그 순간 나는 그 죽음을 떠올립니다. “어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짐승. 달떡처럼 희고 어여뻤던 아기.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
나는 지구 반대편의 오래된 한 도시로 옮겨온 뒤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우연히 1945년 봄 미군항공기가 촬영한 이 도시의 영상을 보게 되지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나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도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깨끗이, 본보기로서 쓸어버리라는 히틀러의 명령 아래” 완벽하게 무너지고 부서졌던 도시, 그후 칠십 년이 지나 재건된 도시 곳곳을 걸으면서 나는 처음 “그 사람-이 도시와 비슷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곰곰이 생각”하기에 이르지요.
오직 목소리만을 들었을 것이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알아들을 수 없었을 그 말이 그이가 들은 유일한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확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그이가 나에게 때로 찾아왔었는지. 잠시 내 이마와 눈언저리에 머물렀었는지. 어린 시절 내가 느낀 어떤 감각과 막연한 감정 가운데, 모르는 사이 그이로부터 건너온 것들이 있었는지. 어둑한 방에 누워 추위를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빛이 있는 쪽」, 36쪽.
나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옮아가기에 이릅니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적처럼 새겨져 있으므로” 나는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통해 세상의 흰 것들을 다시금 만나기에 이릅니다. 희게 얼어 있는 바다여, 태양의 빛이 조금 더 창백해지기 시작하는 서리가 내릴 무렵이여, 죽은 나비의 투명해져가는 날개여, 움켜쥘수록 차가워지는 창백한 두 주먹이여, 검은 코트 소매에 내려앉았다 녹아 사라질 때까지 일,이초를 살다 가는 눈이여, 안간힘을 다해 움켜쥐어온 모든 게 기어이 사라지리란 걸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여, 어느 추워진 아침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증거로 입술에서 처음으로 새어나오는 흰 입김이여,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흰 새여, 날개를 반쯤 접은 새처럼, 머뭇머뭇 내려앉을 데를 살피는 혼처럼 떨어지는 손수건이여,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같은 죽음이여.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초를 밝히고 꽃을 바치는 것이 넋들을 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안다. 살육당했던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래 애도를 연장하려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고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했고,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에 대해 생각했다. 그 넋들이 이곳에서처럼 거리 한복판에서 기려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의 고국이 단 한 번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보다 사소하게, 그녀는 자신의 재건에 빠진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녀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의 넋은 아직 육체에 깃들어 있다.
(……)
그러니 몇 가지 일이 그녀에게 남아 있다;
거짓말을 그만둘 것.
(눈을 뜨고) 장막을 걷을 것.
기억할 모든 죽음과 넋들에게―자신의 것을 포함해―초를 밝힐 것.
-「넋」, 109~110쪽.
결혼을 앞둔 동생의 신부가 죽은 어머니의 몫으로 마련해온 흰 무명 치마저고리를 태우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 올 수 있다면 지금 오기를. 연기로 지은 저 옷을 날개옷처럼 걸쳐주기를.”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들이마실 것”이라고. ‘모든 흰’의 이름으로 알게 되고 앓게 된 통증, 이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견뎌낸 뒤에 나누는 작별의 인사라니 최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인사라 할 수 있겠지요. “둘 사이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소리 없이 일렁이는 거대한 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섞이는 거라지요.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말을 모르던 당신이 검은 눈을 뜨고 들은 말을 내가 입술을 열어 중얼거린다. 백지에 힘껏 눌러쓴다. 그것만이 최선의 작별의 말이라고 믿는다. 죽지 말아요. 살아가요.
-「작별」, 128쪽.
4.
『흰』에는 ‘작가의 말’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작가의 말을 요청하는 편집자에게 한강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이 소설은 전체가 다 작가의 말인걸요.” 어쩌면 이 한 권의 책에서 한강의 소설에 관한 모든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섣부르나마 짐작도 해보거니와 마무리에 이 아름다운 책이 현재 번역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이번에도 한강의 『흰』을 맡았고, 이 책은 2017년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언저리쯤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또한 귀한 선물이 되겠지요. 그 외 다수의 나라에서 번역, 출간 계획 속에 있는 『흰』을 얘기하자니 문득 왜 이 구절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당신에게만은 깨끗한 것을 먼저.” 이 정서를 과연 해외에서는 어떻게들 이해하게 될는지요.
『흰』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벽을 모래로 허물고, 삶과 죽음이라는 단단함을 무르게 만들고, 삶과 죽음이라는 당연함을 낯설게 하고, 삶과 죽음이라는 평면을 입체로 분산시키고, 삶과 죽음이라는 유한을 우주라는 무한으로 확장시킵니다. 넘나든다는 일은 몸에 유연성을 기르는 일이지요. 유연한 사고가 빚어내는 끌어안음은 연대를 이루기에 충분하지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연대, 어차피 모든 산 자는 모두 죽은 자가 될 것이 아닌가요. “아기의 배내옷이 수의가 되고 강보가 관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5.
더불어 한 가지, 소설 『흰』을 채우고 있는 열두 점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흰』은 차미혜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그의 사진과 영상이 한강의 글과 한데 어우러졌다는 데서 일단 그 특별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무엇보다 한 권의 책으로 합집합이 되는 일을 넘어서서 교집합으로, 서로의 고유한 영역이 유지되기도 하고 또 겹치기도 하면서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각각의 영역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특유의 예술성을 한껏 드러내게 되는바, 바로 그 지점이 작은 이 책을 만만치 않은 물성으로 응축하게 만든 힘이 아닐까 하였습니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한 차미혜 작가는 견고해 보이는 기준이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들을 영상, 사진, 퍼포먼스, 설치 등을 통해 표현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작업을 위해 선별하여 고른 열두 점의 사진과 영상 속 스틸 컷은 침묵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삼키고 있는지, 그러나 기실 그 말없음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죽여 있는지, 그 이면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몸에 지니고 있음에 한 컷 한 컷 쉽사리 들어 넘길 수 없는 이미지의 무게를 한 장이라는 찰나에 고스란히 담아내느라 작가 자신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지를 여실히 어떤 떨림으로 느끼게 합니다.
텍스트 사이 그 사이에서 마치 수화를 하듯 속내를 아슬아슬 들키고 있는 이미지들 속에 천천히 눈이 머문다면 보다 느리게 때론 덮었다 다시 펼치는 아낌으로 이 책의 책장들에 바람을 불어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바람에 바람이 스민다는 우연 같은 필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일과 우리가 사라져간다는 일에 문득 말수가 적어져본다면 이 또한 이 책이 주는 숭고한 울림이 아니겠는지요.
(※『흰』ebook에는 사진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흰』
사라질─사라지고 있는─아름다움……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
1.
작가 한강의 신작 소설을 선보입니다. 『흰』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겨울에 기획한 책. 2014년에 완성된 초고를 바탕으로 글의 매무새를 닳도록 만지고 또 어루만져서 2016년 5월인 오늘에야 간신히 꿰맬 수 있게 된 책. 수를 놓듯 땀을 세어가며 지은 책, 그런 땀방울로 얼룩진 책, 다행이라면 “얼룩이 지더라도 흰 얼룩이 더러운 얼룩보다 낫기에.”
이참이 아니라면 ‘흰’이라는 한 글자에 매달려 그가 파생시킨 세상 모든 ‘흰 것’들의 안팎을 헤집어볼 수가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흰’이라는 한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노라니 ‘흰’이라는 한 글자의 생김과 발음에서 끓어 넘친 숭늉처럼 찐득찐득한 슬픔 같은 게 밀려듭니다. ‘흰’, 익숙한 듯 편안했다가 낯선 듯 생경스러워지는 이 느낌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안다고 말할 수도, 또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기묘하고 미묘한 ‘흰’의 세계 속에서 한강이 끌어올린 서사는 놀라우리만치 넓고 깊습니다.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특유의 감각으로 예리하게 건져올린 사유는 얼음처럼 차갑고 막 빻아져 나온 뼛가루처럼 뜨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흰’에서 와서 ‘흰’으로 돌아가지 않던가요. 한강이 백지 위에 힘껏 눌러 쓴 소설 『흰』. 그 밖의 모든 흰 것을 말하는 소설 『흰』. 『흰』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작가로부터 불려나온 흰 것의 목록은 총 65개의 이야기로 파생되어 ‘나’와 ‘그녀’와 ‘모든 흰’이라는 세 개의 부 아래 스미어 있습니다. 한 권의 소설이지만 때론 65편의 시가 실린 한 권의 시집으로 읽힘에 손색이 없는 것이 각 소제목 아래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밀도 있는 완성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얇은 볼륨감을 가진 이 한 권의 소설은 쉽게 읽혀버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느릿느릿 읽게 하다가, 흐린 연필 한 자루를 들어 문장에 혹은 단어에 실금을 긋게 하다가, 다시금 앞서 읽은 페이지로 돌아가 그 앞선 데서부터 다시금 읽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멍울 같은 게 책장에 스미면서 점점 묵직해져가는 소설 『흰』의 무게감을 받치기 위해 불려나온 흰 것들. 예컨대 강보, 배내옷, 달떡, 안개, 흰 도시, 젖, 초, 성에, 서리, 각설탕, 흰 돌, 흰 뼈, 백발, 구름, 백열전구, 백야,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흰나비, 쌀과 밥, 수의, 소복, 연기, 아랫니, 눈, 눈송이들, 만년설, 파도, 진눈깨비, 흰 개, 눈보라, 재, 소금, 달, 레이스 커튼, 입김, 흰 새들, 손수건, 은하수, 백목련, 당의정…… 등등 온통 무참히도 흰 것들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발음해봅니다. 이 소설은 이렇듯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두 가지 과정 속에 불현듯 진정한 제 속내를 들켜주기도 한다지요. 흰 것을 떠올리고 불러내고 불러주고 글로 쓰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흰 것을 보고 흰 것을 읽는 우리를 치유시켜주는 일이 아닐까요. “환부에 바를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거즈”가 결국 한강이 말하고자 하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역할이자 또다른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닐까요.
3.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에 시달리는 ‘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은 제 어머니가 스물세 살에 낳았다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죽었다는 ‘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봄 누군가 나에게 물었지요. “당신이 어릴 때, 슬픔과 가까워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그 순간 나는 그 죽음을 떠올립니다. “어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짐승. 달떡처럼 희고 어여뻤던 아기.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
나는 지구 반대편의 오래된 한 도시로 옮겨온 뒤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우연히 1945년 봄 미군항공기가 촬영한 이 도시의 영상을 보게 되지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나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도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깨끗이, 본보기로서 쓸어버리라는 히틀러의 명령 아래” 완벽하게 무너지고 부서졌던 도시, 그후 칠십 년이 지나 재건된 도시 곳곳을 걸으면서 나는 처음 “그 사람-이 도시와 비슷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곰곰이 생각”하기에 이르지요.
오직 목소리만을 들었을 것이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알아들을 수 없었을 그 말이 그이가 들은 유일한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확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그이가 나에게 때로 찾아왔었는지. 잠시 내 이마와 눈언저리에 머물렀었는지. 어린 시절 내가 느낀 어떤 감각과 막연한 감정 가운데, 모르는 사이 그이로부터 건너온 것들이 있었는지. 어둑한 방에 누워 추위를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빛이 있는 쪽」, 36쪽.
나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옮아가기에 이릅니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적처럼 새겨져 있으므로” 나는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통해 세상의 흰 것들을 다시금 만나기에 이릅니다. 희게 얼어 있는 바다여, 태양의 빛이 조금 더 창백해지기 시작하는 서리가 내릴 무렵이여, 죽은 나비의 투명해져가는 날개여, 움켜쥘수록 차가워지는 창백한 두 주먹이여, 검은 코트 소매에 내려앉았다 녹아 사라질 때까지 일,이초를 살다 가는 눈이여, 안간힘을 다해 움켜쥐어온 모든 게 기어이 사라지리란 걸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여, 어느 추워진 아침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증거로 입술에서 처음으로 새어나오는 흰 입김이여,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흰 새여, 날개를 반쯤 접은 새처럼, 머뭇머뭇 내려앉을 데를 살피는 혼처럼 떨어지는 손수건이여,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같은 죽음이여.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초를 밝히고 꽃을 바치는 것이 넋들을 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안다. 살육당했던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래 애도를 연장하려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고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했고,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에 대해 생각했다. 그 넋들이 이곳에서처럼 거리 한복판에서 기려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의 고국이 단 한 번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보다 사소하게, 그녀는 자신의 재건에 빠진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녀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의 넋은 아직 육체에 깃들어 있다.
(……)
그러니 몇 가지 일이 그녀에게 남아 있다;
거짓말을 그만둘 것.
(눈을 뜨고) 장막을 걷을 것.
기억할 모든 죽음과 넋들에게―자신의 것을 포함해―초를 밝힐 것.
-「넋」, 109~110쪽.
결혼을 앞둔 동생의 신부가 죽은 어머니의 몫으로 마련해온 흰 무명 치마저고리를 태우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 올 수 있다면 지금 오기를. 연기로 지은 저 옷을 날개옷처럼 걸쳐주기를.”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들이마실 것”이라고. ‘모든 흰’의 이름으로 알게 되고 앓게 된 통증, 이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견뎌낸 뒤에 나누는 작별의 인사라니 최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인사라 할 수 있겠지요. “둘 사이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소리 없이 일렁이는 거대한 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섞이는 거라지요.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말을 모르던 당신이 검은 눈을 뜨고 들은 말을 내가 입술을 열어 중얼거린다. 백지에 힘껏 눌러쓴다. 그것만이 최선의 작별의 말이라고 믿는다. 죽지 말아요. 살아가요.
-「작별」, 128쪽.
4.
『흰』에는 ‘작가의 말’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작가의 말을 요청하는 편집자에게 한강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이 소설은 전체가 다 작가의 말인걸요.” 어쩌면 이 한 권의 책에서 한강의 소설에 관한 모든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섣부르나마 짐작도 해보거니와 마무리에 이 아름다운 책이 현재 번역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이번에도 한강의 『흰』을 맡았고, 이 책은 2017년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언저리쯤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또한 귀한 선물이 되겠지요. 그 외 다수의 나라에서 번역, 출간 계획 속에 있는 『흰』을 얘기하자니 문득 왜 이 구절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당신에게만은 깨끗한 것을 먼저.” 이 정서를 과연 해외에서는 어떻게들 이해하게 될는지요.
『흰』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벽을 모래로 허물고, 삶과 죽음이라는 단단함을 무르게 만들고, 삶과 죽음이라는 당연함을 낯설게 하고, 삶과 죽음이라는 평면을 입체로 분산시키고, 삶과 죽음이라는 유한을 우주라는 무한으로 확장시킵니다. 넘나든다는 일은 몸에 유연성을 기르는 일이지요. 유연한 사고가 빚어내는 끌어안음은 연대를 이루기에 충분하지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연대, 어차피 모든 산 자는 모두 죽은 자가 될 것이 아닌가요. “아기의 배내옷이 수의가 되고 강보가 관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5.
더불어 한 가지, 소설 『흰』을 채우고 있는 열두 점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흰』은 차미혜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그의 사진과 영상이 한강의 글과 한데 어우러졌다는 데서 일단 그 특별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무엇보다 한 권의 책으로 합집합이 되는 일을 넘어서서 교집합으로, 서로의 고유한 영역이 유지되기도 하고 또 겹치기도 하면서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각각의 영역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특유의 예술성을 한껏 드러내게 되는바, 바로 그 지점이 작은 이 책을 만만치 않은 물성으로 응축하게 만든 힘이 아닐까 하였습니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한 차미혜 작가는 견고해 보이는 기준이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들을 영상, 사진, 퍼포먼스, 설치 등을 통해 표현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작업을 위해 선별하여 고른 열두 점의 사진과 영상 속 스틸 컷은 침묵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삼키고 있는지, 그러나 기실 그 말없음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죽여 있는지, 그 이면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몸에 지니고 있음에 한 컷 한 컷 쉽사리 들어 넘길 수 없는 이미지의 무게를 한 장이라는 찰나에 고스란히 담아내느라 작가 자신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지를 여실히 어떤 떨림으로 느끼게 합니다.
텍스트 사이 그 사이에서 마치 수화를 하듯 속내를 아슬아슬 들키고 있는 이미지들 속에 천천히 눈이 머문다면 보다 느리게 때론 덮었다 다시 펼치는 아낌으로 이 책의 책장들에 바람을 불어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바람에 바람이 스민다는 우연 같은 필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일과 우리가 사라져간다는 일에 문득 말수가 적어져본다면 이 또한 이 책이 주는 숭고한 울림이 아니겠는지요.
(※『흰』ebook에는 사진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목차
1─나
─ … 9
문 … 15
강보 … 18
배내옷 … 20
달떡 … 22
안개 … 26
흰 도시 … 29
어둠 속에서 어떤 사물들은 … 34
빛이 있는 쪽 … 35
젖 … 37
그녀 … 38
초 … 39
2─그녀
성에 … 47
서리 … 48
날개 … 49
주먹 … 50
눈 … 51
눈송이들 … 54
만년설 … 56
파도 … 58
진눈깨비 … 59
흰 개 … 60
눈보라 … 63
재 … 66
소금 … 67
달 … 69
레이스 커튼 … 71
입김 … 72
흰 새들 … 73
손수건 … 76
은하수 … 77
하얗게 웃는다 … 80
백목련 … 81
당의정 … 82
각설탕 … 83
불빛들 … 85
수천 개의 은빛 점 … 86
반짝임 … 87
흰 돌 … 88
흰 뼈 … 89
모래 … 90
백발 … 91
구름 … 94
백열전구 … 95
백야 … 96
빛의 섬 … 97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 98
흩날린다 … 100
고요에게 … 101
경계 … 104
갈대숲 … 106
흰나비 … 108
넋 … 109
쌀과 밥 … 111
3─모든 흰
─ … 117
당신의 눈 … 118
수의 … 120
언니 … 121
백지 위에 쓰는 몇 마디 말처럼 … 123
소복 … 124
연기 … 125
침묵 … 126
아랫니 … 127
작별 … 128
모든 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