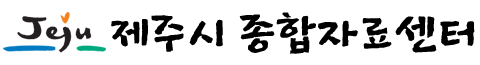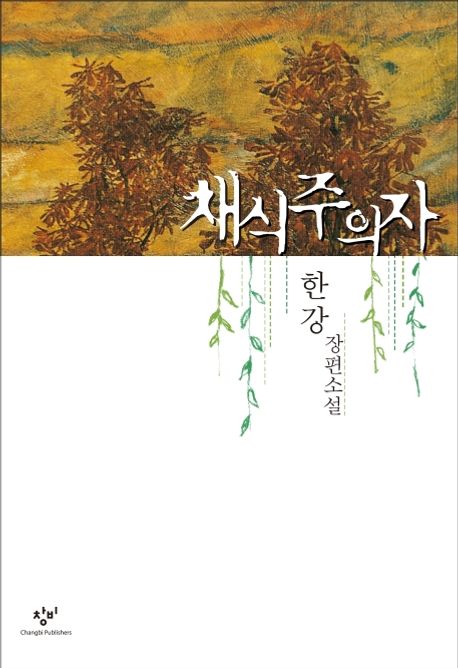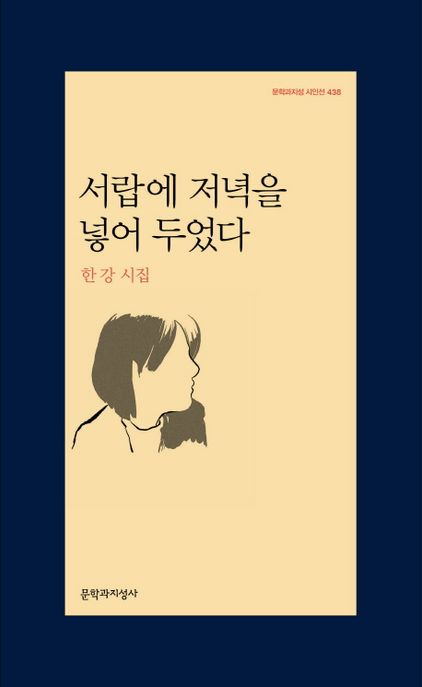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한강 시집
- 저자/역자
- 한강 지음
- 펴낸곳
- 문학과지성사
- 발행년도
- 2013
- 형태사항
- 165 p.; 21 cm
- ISBN
- 9788932024639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811.6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북카페 | JG0000008214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JG000000821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북카페
책 소개
심해의 밤, 침묵에서 길어 올린 핏빛 언어들
상처 입은 영혼에 닿는 투명한 빛의 궤적들
한강 문학의 시적 기원!
“한강의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림의 실재가 궁금했던 사람들은
이제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펼치면 된다”
1993년 계간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시 「서울의 겨울」 외 4편을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한강이 틈틈이 쓰고 발표한 시들 중 60편을 추려 묶어 데뷔 20년 만에 펴낸 첫 시집이다. 인간 삶의 고독과 비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진실과 본질적인 정서들을 특유의 단단하고 시정 어린 문체로 새겨온 시인은 한국소설문학상(1999),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0), 이상문학상(2005), 동리문학상(2010), 만해문학상(2014), 황순원문학상(2015), 인터내셔널 부커상(2016), 말라파르테 문학상(2017), 김유정문학상(2018), 산클레멘테 문학상(2019), 대산문학상(2022), 메디치 외국문학상(2023),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2024), 노벨문학상(2024)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녁의 소묘」 「새벽에 들은 노래」 「피 흐르는 눈」 「거울 저편의 겨울」 연작들의 시편 제목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조가 충분히 감지되는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더욱 명징해지는 존재와 언어를 투명하게 대면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말과 동거”하는 숙명을 안은 채 “고통과 절망의 응시 속에서 반짝이는 깨어 있는 언어-영혼”(문학평론가 조연정)을 발견해가는 환희와 경이의 순간이 여기에 있다.
내가 가진 모든 생생한 건
부스러질 것들
부스러질 혀와 입술,
따뜻한 두 주먹
부스러질 맑은 두 눈으로
유난히 커다란 눈송이 하나가
검은 웅덩이의 살얼음에 내려앉는 걸 지켜본다
무엇인가
반짝인다
―「저녁의 소묘 4」 부분
죽음에서 삶이, 어둠에서 빛이 탄생하는 아이러니
늦은 오후에서 한밤으로 건너가는 시간(저녁), 다시 한밤에서 날이 새기 직전의 시공간(새벽)에 주로 깨어 있는 시인은 “부서진 입술//어둠 속의 혀”로 “허락된다면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피 흐르는 눈 3」) 한다.
이 어스름한 저녁을 열고
세상의 뒤편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등을 돌리고 있다
고요히 등을 돌린 뒷모습들이
차라리 나에겐 견딜 만해서
―「피 흐르는 눈 4」 부분
인간의 삶에 구체적이고 특별한 불행들이 생겨나기 이전, 시인은 “아직 심장도 뛰지 않는/점 하나로/언어를 모르고/빛도 모르고/눈물도 모르며/연붉은 자궁 속” “죽음과 생명 사이,/벌어진 틈”(「마크 로스코와 나」)에서 고통의 기원과 진실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어깨를 안으로 말고/허리를 접고/무릎을 구부리고 힘껏 발목을 오므려서”(「심장이라는 사물」) 자신의 피 흘리는 육체를 담보 삼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누군가 내 몸을 두드렸다면 놀랐을 거야
누군가 귀 기울였다면 놀랐을 거야
검은 물소리가 울렸을 테니까
깊은 물소리가 울렸을 테니까
둥글게
더 둥글게
파문이 번졌을 테니까
―「눈물이 찾아올 때 내 몸은 텅 빈 항아리가 되지」 부분
몸속에 맑게 고였던 것들이
뙤약볕에 마르는 날이 간다
끈적끈적한 것
비통한 것까지
함께 바싹 말라 가벼워지는 날
―「해부극장 2」 부분
마르고 텅 비어가는 그 육체는 영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지(同志)이기에 결국 영혼도 부서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균열의 느낌은 어김없이 찾아든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전문
그러나 시인은 이런 상실감과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정면승부를 한다. 스스로에게 재우쳐 다짐하듯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짐작건대 그가, 시집의 5부(‘캄캄한 불빛의 집’)에 실린, 대부분 시인의 이십대에 씌어진 시들에서 목도할 수 있는 벅찬 숨결, 더운 핏줄, 열정적 사랑, 푸릇한 청춘의 시절을 통과해왔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정면을 보며 발을 구를 것
발목이 흔들리거나, 부러지거나
리듬이 흩어지거나, 부스러지거나
얼굴은 정면을 향할 것
두 눈은 이글거릴 것
마주 볼 수 없는 걸 똑바로 쏘아볼 것
그러니까 태양 또는 죽음,
공포 또는 슬픔
그것을 이길 수만 있다면
심장에 바람을 넣고
미끄러질 것, 비스듬히
―「거울 저편의 겨울 9―탱고 극장의 플라멩코」 부분
薄明 비껴 내리는 곳마다
빛나려 애쓰는 조각, 조각들
아아 첫 새벽,
밤새 씻기워 이제야 얼어붙은
늘 거기 눈뜬 슬픔,
슬픔에 바친다 내
생생한 혈관을, 고동 소리를
―「첫 새벽」 부분
삶을 관통하는 불꽃같은 고통, 그토록 가슴 시린 한강 언어의 기원
이제 “얼음의 종이를 통과해/조용한 저녁이 흘러”(「저녁의 소묘 3」)들 때, 어둠 속에서 건너가보는 꿈속에서, 거울 저편의 정오나 혹은 거울 밖 검푸른 자정에서 “동그랗게 뒷걸음질 치는”(「심장이라는 사물」) 혀를 이용해 시인이 닿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언어, 삶의 본질, 고통과 절망 너머의 어떤 절실함과 회복의 풍경들이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부분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 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회복기의 노래」 전문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는 침묵의 그림에 육박하기 위해 피 흘리는 언어들이 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언어의 심장을 뜨겁게 응시하며 영혼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확인하려는 시인이 있다. 그는 침묵과 암흑의 세계로부터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렸던 최초의 언어에 가닿고자 한다. 이 시집은 그간 한강 문학을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언급돼온 강렬한 이미지와 감각적인 문장들 너머에 자리한 어떤 내밀한 기원-성소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목차
시인의 말
1부 새벽에 들은 노래
어느 늦은 저녁 나는 | 새벽에 들은 노래 | 심장이라는 사물 | 마크 로스코와 나 | 마크 로스코와 나 2 | 휠체어 댄스 | 새벽에 들은 노래 2 | 새벽에 들은 노래 3 | 저녁의 대화 | 서커서의 여자 | 파란 돌 | 눈물이 찾아올 때 내 몸은 텅 빈 항아리가 되지 | 이천오년 오월 삼십일, 제주의 봄바다는 햇빛이 반. 물고기 비늘 같은 바람은 소금기를 힘차게 내 몸에 끼얹으며, 이제부터 네 삶은 덤이라고
2부 해부극장
조용한 날들 | 어두워지기 전에 | 해부극장 | 해부극장 2 | 피 흐르는 눈 | 피 흐르는 눈 2 | 피 흐르는 눈 3 | 피 흐르는 눈 4 | 저녁의 소묘 | 조용한 날들 2 | 저녁의 소묘 2 | 저녁의 소묘 3
3부 저녁 잎사귀
여름날은 간다 | 저녁 잎사귀 | 효에게. 2002. 겨울 | 괜찮아 | 자화상. 2000. 겨울 | 회복기의 노래 | 그때 | 다시, 회복기의 노래. 2008 | 심장이라는 사물 2 | 저녁의 소묘 4 | 몇 개의 이야기 6 | 몇 개의 이야기 12 | 날개
4부 거울 저편의 겨울
거울 저편의 겨울 | 거울 저편의 겨울 2 | 거울 저편의 겨울 3 | 거울 저편의 겨울 4 | 거울 저편의 겨울 5 | 거울 저편의 겨울 6 | 거울 저편의 겨울 7 | 거울 저편의 겨울 8 | 거울 저편의 겨울 9 | 거울 저편의 겨울 10 | 거울 저편의 겨울 11 | 거울 저편의 겨울 12
5부 캄캄한 불빛의 집
캄캄한 불빛의 집 | 첫새벽 | 회상 | 무제 | 어느 날, 나의 살은 | 오이도 | 서시 | 유월 | 서울의 겨울 12 | 저녁의 소묘 5
해설
개기일식이 끝나갈 때 · 조연정